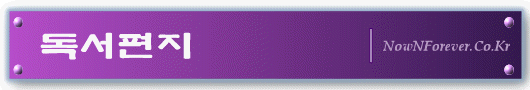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고유어 인명 - 돌쇠면 어떻고 개똥이면 어떤가
고향 마을에 개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저씨가 계셨다. 간혹 친구분들과 허물없이 주고 받던 농담이 생각난다. "야 이 똥개야, 느거 모심기 언제 할 끼고?" "이놈아, 이름 좀 똑바로 부르거라. 내가 우째 똥개고?" 이때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말추념에 든다. "아따, 똥개나 개똥이나 그게 그거 아잉가." 이 아저씨의 젖먹이 이름이 개똥이다보니 그만 평생의 본명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요즘 사람 같으면 진작 버렸어야 할, 이 천한 이름을 아저씨는 용케 평생 간직해 왔다.
언젠가 "이산가족 찾기"에 나오는 노인분들의 이름에서 김간난, 이언년, 박삼월, 최자근애기, 정음전, 조복실, 박몽실, 김조갑등 낯익은 이름을 대할 수 있었다. 간난은 갓 낳은 이를 뜻하고, 언년은 아들을 바랐으나 기대에 어긋난 여자(년), 조갑은 여성을 상징하는 "조가비"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런 고유 이름은 대게 강아지, 두꺼비와 같은 동물명이나 마당, 우물 가와 같은 출생지에서 따온 것들이다. 또 삼월이, 보름과 같은 출생 시기나 이쁜이, 깜둥이와 같은 용모나 성격에서 딴 이름도 더러 있다. 현대인의 정서에는 유치한 듯 보이나 재미있고 소박하기 이를데 없는 이름들이 아닌가.
앞서 말한대로 우리 조상들의 이름은 삼국시대까지는 순수한 고유어로 지어지고 음절수에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 거시마루(거칠부), 이사도(이차돈), 흑치상지, 노리사치계, 구례칠급벌간, 아라눌척실리, 동오로첩목아 등등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어형을 재구하기 어려우나 모두 전통적인 우리말임에 틀림이 없다. 옛이름 중에 우리는 아직도 의리의 사나이 돌쇠를 기억하고 있다. 가장 흔했던 이름이면서 천하게 여기는 "돌쇠"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 고허촌장이 소벌도리였고 지증왕의 본 이름이 지도리였다. 여기서 도리는 "돌"로 축약되어 "순돌이, 꾀돌이, 바람돌이, 호돌이, 꿈돌이"등과 같이 남자 이름의 애칭으로 쓰인다. 그런데 이 "도리, 돌"을 단순히 돌(석)로 생각하여 특별히 한국식 한자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 돼지의 옛말 "돌"로 생각하여 자식을 일러 우리집 "똘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본래의 "도리"는 돌도 돼지도 아니고 귀한 자식을 이르는 호칭어였음을 알아야 한다. 어디 도리, 돌뿐일까. 돌쇠, 마당쇠의 인명 접미서 "쇠"가 그렇고, 장사치, 양아치의 "치", 뚱보, 울보의 "보", 검둥이, 귀염둥이의 "둥" 같은 보통 이름들이 세태의 변천에 따라 한결같이 흔해빠진 천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오로지 한자말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말 이름을 천시한 데서 비롯된 일종의 언어 사대주의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성씨나 이름이 지금처럼 한자어로 틀을 갖추게 된 것은 1910년 민적부 작성 이후의 일이다. 채 벽년 안되는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방식을 수천년 내려온 전통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한자 이름 일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결코 내세울 만한 일도 분명 아니다. 그런데 최근 서구계 중심의 외래어가 우리 이름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패티 김, 쟈니 윤, 앙드레 김과 같은 일부 연예계 인사들에서 JP, YS, DJ와 같은 정계 인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유명인이나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언어사대주의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우리말 이름이 되살아나는 바람직한 현상도 눈에 띈다. "금난새"라는 음악가의 이름에서 비롯되어 이후 "고운 이름짓기" 모임을 중심으로 배우리, 이대로, 신난다, 박보람, 이하나, 서달샘, 서바로, 손세모돌, 한빛나리 등의 이름이 뒤를 잇고 있어 이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다.
옛 선인들의 이름 가운데 누리, 나라, 마루, 서리, 아리, 수리, 고마등의 고유어는 지금도 되살려 쓰고 싶은 이름들이다. 고유어라고 해서 무조건 촌스럽고 고리타분한 것은 아니다. 생각을 바꾸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련된 이름으로 거듭 날 수 있다. 요는 우리것을 찾고 이를 아끼는 마음가짐에 있다고 하겠다.
젖이름이란 대게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에서 이레만에 지여주는 이름으로 남자의 경우 관례 때까지, 여자의 경우는 죽어서 장례 때까지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남자 젖이름의 대명사 "노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그저 "놈아"의 호칭에 불과하다. "아이고, 내 강아지야!", "이렇게 이쁜 내 새끼", "우리집 돼지들이 잘도 먹는구나" 필자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서 자주 듣던 호칭어들이다. 똥, 오줌을 가리게 된 자식에게 밥을 맛있게 잘 먹는 자식들에게 우리의 어버이들이 곧잘 쓰던 애칭이 아니던가.
예로부터 천명위복이라 했다. 천한 이름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인데, 이처럼 저명한 인사의 이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상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의 용모나 개성이 잘 드러나고 부르기 좋으며 기억하기 쉬우면 그만일 터이다. 장수라고 해야 꼭 오래살고 명철이라 해야 꼭 똑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돌쇠면 어떻고 개똥이면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