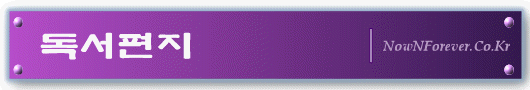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말의 어원 - "말"이라는 말의 뿌리
"혓바닥을 조심하라"는 속언이 있다. 중국 속담에도 "세 치의 혓바닥이 다섯 자의 몸을 좌우한다"는 무서운 경고가 있다. 모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성 속담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혀(설)가 말(어원)을 지칭함은 금새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말과 뿌리가 같다는 몽골어에서도 혀를 "kele"라 한다. 중세 문헌에 "?"로 표기되었던 "가로다"가 바로 그 흔적이다. 유교 경전에 "공자 왈, 맹자 왈"하는 그 왈을 번역한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의 가로다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발음 기관가운데서도 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 혀에 언어라는 의미가 부가된 것이다. 영어의 "language"의 뿌리인 라틴어의 "lingua"가 혀를 지칭하는 말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몽골어나 서구어에서 보듯 "말"이라는 말의 뿌리가 혀에 있음을 알았다. 혀를 한자로 설이라 하는데, 이 설 역시 언어의 의미로 쓰인다. 우리가 글을 잘못 쓰면 필화를 당하고, 말을 잘못하면 설화를 입는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나 끔직한 봉변을 당했을 때 흔히 "필설로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 붓 끝이나 혓바닥이 미처 그 정황을 모두 그려낼 수 없다는 뜻이다.
설대라는 한자말도 있다. 혓바닥을 대신한다는 뜻이니 말 대신에 글로 알릴 때 쓰는 말이다. 이를테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에 갔다가 그가 부재중일 때 이런 쪽지를 남긴다."설대 - 이 친구야, 지금이 어느땐데 그렇게 짤짤거리며 싸댕기냐? 다름이 아니구 아무날 아무시에 아무곳으로 나오너라. - 친구 아무개가."
"말"이 우리 고유어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어원만은 확실히 밝힐수 없음이 유감이다. "말"과 "혀"는 어형부터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어가 문명국 언어임을 자처하면서도 지금껏 제대로 된 어원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이 "말"의 뿌리조차 캐내지 못한 데 이유가 있기도 하다. "말:의 어원에 대하여 어떤이는 인도 드라비다 어의 "말루(marru)"와 동계어라 주장하기도 하고, 또 "말미암다"의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인연설은 어떤 말이든지 그것이 생성된(말미암은) 필연적인 연유가 있다는 주장인데,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말의 기원어를 "맏"으로 재구하여 "묻-"이나 "믿-"도 모두 기원어인 "맏"의 모음교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무당을 일컫는 "무꾸리"는 "묻-"의 파생어로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일을 신에게 물어보는 중개인이라고 설명한다. 한자의 "믿을신"자가 "사람인"변에 "말씀언"을 쓰고 있는데,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데서 "맏(말)"과 "믿"이 말뿌리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말"에 대한 어사로 "곧"을 들기도 한다. 잠꼬대는 잠과 "곧+애"의 합성으로 잠결에 하는 말이며, "곧이듣는다"나 "고자질(곧+아+질)", "꾸중(굳,곧+웅)"등이 모두 말을 뜻하는 "곧"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본능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계통을 캐는 일만큼이나 언어의 뿌리를 캐는 일, 즉 어원 탐구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현재 쓰이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감정이나 의식에서 생성되었는가를 밝혀 준다는 점에서 어원 탐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말의 뿌리를 캐는 일은 우리 민족의 기원과 민족성을 밝히는 일과도 직결된다. 한국인의 정서나 사상 또는 의식 구조는 한국인이 쓰는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언어, 특히 우리만이 쓰고 있는 한국어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드물 것이다. 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반만년에 걸쳐 생성, 발전해 온 우리말과 반 천년에 걸쳐 갈고 닦아 온 우리글이 있음에 대해 깊이 고마워해야 한다. 흔히 말은 그 사람 자체로 평가된다. 말 곧 언행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물론 그가 지닌 지식이나 교양등 인간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 당나라에서 관리를 뽑을 때 평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받아들여져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으로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의 생김새나 차림새가 아니라 그가 구사하는 말씨(글씨)에 있다고 하겠다.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언어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언어에 의하여 인간이 만들어진다"고 단언하였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가린다"고 하지 않았던가.
말의 중요성을 무엇에 비유하랴. 우리에게 우리만의 정서나 생각을 담는 한국어와 한국 문자가 있음을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노산 선생의 "애국시"에 있는 "겨레여,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이라는 구절을 상기하자. 이 구절을 "겨레여, 우리에게 우리말이 있다. 내 사랑 바칠 곳은 오직 여기뿐..."으로 고쳐 불러도 좋으리라.
|

논개
임진년 왜란을 일으킨 왜적은 진주성을 여러 번 쳤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3년 진주성을 무너뜨려 사람과 짐승 씨 하나 남기지 말라 명했다. 대군과 맞서 여러 차례 싸움에서 지켜낸 진주성도 기어이 무너지고 말았다. 촉석루에서 축하 잔치를 벌인 왜적들, 돋은 바위 위 한 여인의 아리따움에 홀린 왜장 게야무라.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마음’의 ‘논개’(論介)는 열손 가락지 낀 손을 깍지 껴 그를 안고 ‘강낭콩보다 더 푸른’ 남강으로 뛰어들었다.
논개라는 이름은 남자이름으로도 쓰였는데, 밑말 ‘논’에 ‘개’가 더해진 이름이다. 이름접미사 ‘-개’는 ‘-가’(加), ‘-가이’(加伊)와 뒤섞여 쓰였다. 명가(明加)/명개(明介), 풍가(豊加)/풍개(豊介)/풍가이(豊加伊). 동국신속삼강행실에는 한자로는 是加(시가)·楊加(양가)·億壽(억슈)·仇守(구슈)·梅花(매화)·葵花(규화), 한글로는 낱낱 ‘시개·양개·억슈ㅣ·구슈ㅣ·매홰·규홰’로 적고 있다. 홀소리로 끝나는 말끝에 /ㅣ/가 덧대지는 규칙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름접미사 ‘-가’가 ‘-가이/개’로 바뀌는 것 또한 이런 규칙의 영향인 듯하다.
고온개·난개·노난개·어둔개·언개·이른개·쟈근개 따위의 이름은 ‘고운 게, 난 게, 노는 게, 어둔 게, 언 게, 이른 게, 작은 게’처럼 들린다. ‘-개’가 단순히 이름접미사로 쓰인 이름에 가디개·검쇠개·긋개·귿탕개·기ㅁ.개·논개·눈개·똥개·막개·망죵개·미ㄴ.ㄹ개 ·범개·보롬개·복개·블개·삼개·솝동개·수개·슌개·씨개·어영개·언개·엄개·움개·허롱개가 있다.
최범영/한국지질자원연구원
꽃무릇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갔더니 ….”(서정주·선운사 동구에서),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최영미·선운사에서)이라고 동백꽃을 노래했지만, 지금 선운사에는 ‘꽃무릇’이 불타고 있다. 영광 불갑사, 함평 용천사, 장성 백양사 쪽도 한창이다.
‘꽃무릇’은 ‘꽃+무릇’으로 된 말인데, ‘무릇’의 뜻을 가늠하기 어렵다. 어떤 이는 무리지어 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무리지어 피는 꽃이 어디 한둘이랴. 오히려 ‘무릇하다: 좀 무른 듯하다’는 뜻과 관련지을 수 있을 듯한데, ‘밥을 무릇하게 짓는다’고도 한다. 무릇을 ‘물고리/ 물구’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런데 무릇은 무르지 않아 꽃대로 조리를 만들기도 했던 것을 보면, 반그늘 습지에서 자라는 점을 반영한 이름이 아닐까 싶다.
한자 이름은 ‘석산’(石蒜)이다. 흔히 ‘상사화’(相思花)와 혼동하는데, 같은 수선화과지만, 꽃무릇은 9~10월에 피고, 상사화는 6~7월에 피고 키도 크다.
후제 어느 시인이 읊을 멋들어진 꽃무릇 노래를 기대해 본다. 꽃말이 ‘슬픈 추억’이라니 불타는 쓰린 사랑의 노래가 나올 법도 하다.
임소영/한성대 언어교육원 책임연구원,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부문과 부분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미국 영화계의 가장 큰 연중행사로 매년 봄에 열리며 세계적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전 배우들의 불참 등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올해 시상식에서는 니콜 키드먼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뮤지컬 영화 '시카고'가 6개 부문을 석권하는 등 2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겐 '오스카'라는 애칭의 인간입상(人間立像)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스카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각 '부문' 수상자를 소개하면서 '부분'이라고 혼동해 쓰는 경우가 많다. '부문'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를 뜻한다. 중공업 부문, 사회과학 부문, 자연과학 부문 등과 같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 분류해 놓은 것이다.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다. 앞부분, 세 부분, 썩은 부분 등과 같이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다. 따라서 문화·예술·학술 등에서의 각 분야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문'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고, 앞으로도 가요·연기 등 시상식이 많다. 진행자들은 '부문'을 '부분'이라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배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