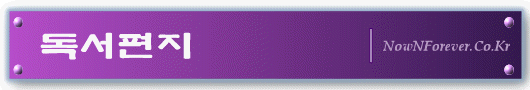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모어에 대한 재인식
미각어의 다양성 - 달짝지근하고 달콤새콤하고
우리말에서 맛을 나타내는 어사, 곧 미각어만큼 발달한 분야도 없을 듯 하다. 미각어를 대할 때마다 그 절묘한 뉘앙스나 다양한 표현법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한다. "달다, 쓰다, 맵다, 짜다, 싱겁다, 시다, 떫다, 고소하다, 밍밍하다, 텁텁하다, 느끼하다, 부드럽다, 깔깔하다, 껄쭉하다"등의 고유 미각어는 단순히 혀 끝에 감도는 맛의 표현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런 형용사는 맛의 묘사뿐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나 사물에 대한 느낌 또는 성격에 이르기까지 의미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고소하다"의 모음교체가 "구수하다"지만 그 쓰임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미운 녀석이 욕을 볼 때는 고소하다고 말하지만 껄쭉한 입심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구수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시다"라는 미각어도 묵은 김치나 식초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신맛만은 아니다. 삐끗하여 삔 발목이 밤새 시기도 하고, 아니꼬운 장면을 보면 눈꼴이 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것은 요즘 신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를 가리켜 "쉰세대"라 부른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쉰 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묵은 김치처럼 맛이 간, 쉬어 버린 세대란 사실이 기성 세대의 신경을 건드린다. 고약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니나 그리 틀린 말은 아닌 듯하여 더 이상 이의를 달지 못한다.
"쓰다"도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하다. 쓴 잔을 마시면 기분이 씁쓸하지만 쓴맛이라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쓴 소리나 쓴 약은 당장은 그렇지만 훗날 좋은 약이 될 수 있고, 또 쓴맛에서 나온 쌉쌉하고 쌈싸름한 맛은 오히려 매력 있는 음료수가 될 수 있다. 짠 맛도 마찬가지여서 기분상 뒷맛이 개운치 않을 때는 "찝찔하다"며 눈살을 찌푸리지만 사업이 잘되어 쏠쏠히 돈을 벌 때는 수입이 "짭짤하다"고 만면에 웃음을 띤다. 또한 덜 익은 감맛만 떫다고 하지 않는다. 떫은 표정이란 말이 있는데, 무언가 마음에 차지 않아 떨떠름한 기색을 내보일 때 사람들은 대게 이렇게 묻는다. "무엇이 떫어요?"
"먹다"라는 말의 사용 범위가 무제한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밥도 먹고, 나이도 먹고, 뇌물도 먹고, 귀도 먹고, 욕도 먹고, 양심을 먹고... 또 "씹다"의 의미 영역도 만만치 않다. 외로울 때는 고독을 씹고 윗사람이 없을 때는 그를 안주 삼아 잘근잘근 씹어 돌릴수 있으니 말이다.
맛의 표현법에 관한 한 우리말은 참으로 우수한 언어라 자부할 만하다. 접사에 의한 파생어가 부지기수일 정도로 변화무쌍한 조어법은 단연 타언어의 추종을 불허한다. 단맛의 경우 아주 달면 "달디달다"요, 알맞게 달면 "달콤"이요, 약간 달면 "달짝지근"이다. 게다가 약간 달콤하면서 신맛이 곁들이면 "달콤새콤"이다. 신맛도 이에지지 않는다. 시디시다에서 기금, 시큼, 시쿰, 새콤으로 변용되고 다시 시금털털, 시그무레, 새그랍고, 새곰새곰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맛갈이 있다는 "심심하다"나 "삼삼하다"에 이르면 그 절묘한 뉘앙스가 절정에 달한다. 이런 미각어를 대체 어떻게 다른 외국어로 옮길까?
"삼삼하다"의 진의를 한번 되씹어 보자. 미각어로서의 본뜻에 국한시킨다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맛깔이 있다는 것인데, 때로 잊혀지지 않고 눈에 어린다는 뜻으로도 전이된다. 군에 간 맏이의 모습이 어머니의 눈에 삼삼하고, 떠난 님의 달콤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삼삼하다. 뿐인가, 늘씬한 아가씨를 보았을 때 뭇 남성들은 "참 삼삼한데..."라면서 내심 탄성을 발하기도 한다. 때로 군침을 삼키는 남성도 있을 법한데, 어떻든 삼삼하다는 어사는 미각뿐 아니라 청각에서 시각에 이르기까지 의미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삼삼한 아가씨"처럼 미각과 연관시킨 표현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간의 성격을 음식 맛에 빗댄 표현법인데, 예컨대 싱거운 사람, 짠돌이, 달콤한 여자, 질긴 사람 등등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외국인들이이런 우리말을 듣는다면 우리를 식인종쯤으로 오해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밥맛이다, 꿀맛이다, 죽을 맛이다,를 비롯하여 달콤한 속삭임, 쓰디쓴 과거, 매운 날씨, 떫은 표정, 짠 점수, 신소리등의 차원 높은 표현법을 이해한다면 그런 오해는 쉽게 풀릴 수 있으리라.
미각어 자체가 명사로 된 말도 있다. "맵사리"가 그것인데, 이는 심메마니들이 고추를 저희들끼리 부르는 은어이다. 표준어로도 맵고 싸한 맛을 "맵싸하다"고 하고, 맵고도 차가운 맛을 "맵차하다"고 한다. 맵다는 말은 매운 날씨처럼 모질고 독한 성질만 일컫는 것이 아니고 "손끝이 맵다"에서 보듯 때로는 옹골차고 야무진 성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매운 손끝과 비슷한 말로 "여물다" 또는 "야물다"가 있다. 속이 꽉 찼다는 끗인데, 이 여물(야물)에 "딱지다"라는 꼬리가 붙어 "야물딱지다"라는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 낸다. 실없는 사람을 가리켜 "싱겁이"라 하고 지독한 구두쇠를 일러 "짠돌이(여자의 경우 짠순이)"라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알뜰 살림꾼을 일러 "야물딱이"라 불러도 좋겠다. 요즘같이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씀씀이가 헤픈 푼수댁보다 손끝이 매운 야물딱이 주부가 바람직하겠다.
우리말에서 이러한 미각어의 발달이 우리가 늘 맛있는 음식을 즐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먹어 배고픈 가운데서 나왔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어려움 속에서 얻는 작은 행복, 작은 여유라고나 할까. 멋은 맛에서 나온 말로서 진정한 멋은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얻은 것이기에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

나들이
말과 글이 같이 가는 요즘 들어서는 말인사와 글인사의 차이가 별로 없다. 사람과 경우에 따라 갖가지 인사말을 가려 쓸 수는 있겠지만, 전날처럼 “기체후 일향 만강하옵신지요? 별래무양하신지요? 옥체 만안하시온지요? …”(氣體候 一向 萬康-, 別來無恙-, 玉體 萬安-) 식으로 편지를 써야 격식을 갖춘 것으로 여기는 이는 거의 없다. 굳이 격식을 따진다면, “안녕하십니까?” 정도로 갖추어 하는 말과 “안녕하세요! 안녕! …” 식으로 줄여서 말하거나 건성으로 하는 인사 차이 정도다.
며칠 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국민에게 한 인사말이 “잘 다녀오겠습니다”였다. 이 말은 집이나 동네를 나설 때 어른들한테 해도 두루 통할 정다운 인사말이다. 인민이 하늘이라지만 듣는이를 높여서 하는 대통령의 이 소박한 인사를 외면하는 이가 있었을까? 남북 정상이 만나 손을 맞잡고 주고받던 말 “반갑습니다!” 역시 보통 사람의 인사말과 다를 게 없다. 그들이 초면이 아니었으면 “반갑습니다!” 다음에 “오랜만입니다” 또는 “오랜만에 뵙습니다”란 말이 덧붙었을 터이다.
지구 반대쪽도 며칠이면 다녀올 수 있고, 전화나 인터넷이면 어디서나 초를 다퉈 말글이 오가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울고 불며 하직인사가 길어질 일이 없어졌고, 그리움·걱정 같은 마음도 말도 거추장스러워졌다. “하루 더 묵었다 가시지요”나 “며칠 더 노시다 가시지요”도 헤어지기 전에 하던 통상적인 인사말이지만, 요즘은 좀체 듣기 어려운 곡진한 인사가 된 성싶다.
최인호/한겨레말글연구소장
기윽 디읃 시읏
남녘의 현행 한글맞춤법에서 ‘ㄱ·ㄷ·ㅅ’의 이름은 ‘기역·디귿·시옷’이다. 북녘의 조선어철자법에서는 ‘기윽, 디읃, 시읏’이다. 다른 자음의 이름은 모두 같다. 자음 이름에는 규칙이 있다. 자음에 모음 ‘이’를 결합한 첫 음절과, 모음 ‘으’에 해당 자음을 결합한 둘째 음절을 이름으로 한다. ‘치읓·키읔·티읕·피읖·히읗’ 등이 그것이다.
이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름은 최세진이 1527년에 지은 ‘훈몽자회’에서 비롯되었는데, 관습적으로 쓰이는 이름을 인정한 남녘 규범과 통상적인 이름을 규칙에 맞도록 바로잡은 북녘 규범의 차이 때문이다.
훈몽자회는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인데 한자 공부를 위해 한글(훈민정음)로 음을 달았다. 이 책에 한글의 쓰임과 음을 익힐 수 있도록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한자로 소개했는데, 그것이 한글 자모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ㄱ’을 ‘其役’(기역)으로 적어서 ‘기’의 첫소리와 같고, ‘역’의 끝소리와 같다고 설명한 것이다. ‘ㄴ’은 ‘尼隱’(니은)으로 적었다.
‘ㄱ·ㄷ·ㅅ’을 ‘기역·디귿·시옷’으로 적은 이유는? 한자 가운데 ‘윽, 읃, 읏’으로 발음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윽’은 발음이 비슷한 ‘역’(役)으로 적고, ‘ㄷ’은 ‘池末’으로, ‘ㅅ’은 ‘時衣’으로 적은 뒤 ‘末, 衣’에는 표시를 해 두었다. 그 표시는 훈독, 곧 한자의 뜻으로 읽으라는 것이다. ‘귿 말’(끝 말)자를 ‘귿’으로 읽고, ‘옷 의’자를 ‘옷’으로 읽으면, ‘디귿, 시옷’이 된다. ‘池’는 16세기에 ‘디’로 발음되었다.
김태훈/겨레말큰사전 자료관리부장
설거지나 하세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없다. 빈 식탁에 흰 종이 한 장만 달랑 놓여 있다. '여보 시장 갔다 올께, 밥 차려 먹어.' 아유, 밥이나 좀 차려 놓고 가지. 그렇지만 내가 간 큰 남편은 아니잖아. 냉장고 뒤져 김치 꺼내놓고 밥통에서 밥을 퍼 얌전히 식탁 앞에 앉는다. 그런데 '갔다 올께'라고? 밥은 못 차려주더라도 쪽지는 제대로 써야지. 맞춤법 바뀐 지가 언젠데. 어디 이걸로 한번 기를 꺾어 볼까? 아직도 맞춤법이 바뀐 걸 모르는 분들은 살짝 알려드릴 테니 기억해 두기 바란다.
전에는 '갈께''할께'처럼 '-ㄹ께'로 적는 게 옳았다. 하지만 이젠 '갈게''할게'처럼 표기하는 게 맞다. 자세히 설명하면 ⑴'-ㄹ게''-ㄹ지니라''-ㄹ지어다''-올시다' 처럼 의문을 나타내지 않는 어미들은 예사소리로 적고 ⑵ '-ㄹ까''-ㄹ꼬''-리까''-ㄹ쏘냐'처럼 의문을 나타내는 것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딩동.' 아 드디어 오셨군. 장바구니부터 받아놓고…. '여보, 이리 앉아봐요. 1988년에 맞춤법이 바뀌어서 이젠 '갔다 올께'란 말은 없어졌어. '갔다 올게'라고 써야지.' '뭐라고요, 이 양반이.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설거지나 하세요.'
김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