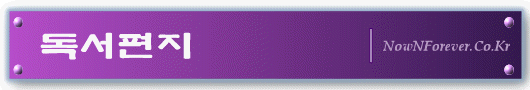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생활 속의 우리말
우리말 숫자관 - 닫히고 열리기가 골백번
필자가 12라는 숫자를 선호하게 된 것은 대학과 대학원 입시 때 수험번호가 모두 12번이었던 데서 비롯된다. 학번과 군번을 비롯하여 열 두번의 이사 횟수에 이르기까지 묘하게도 이 숫자는 나와 인연이 깊다. 20여 년 전 "12, 12 사태"란 것이 생겨서 한국 정치사에 고약한 시비거리를 제공한 바도 있지만, 1년 열두 달, 간지에서 12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 등등 대체로 12는 행운의 수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확히 셀 수도 없는 금강산의 봉우리도 1만 2천 봉이라고 자랑한다. 숫자관이라고 할까, 우리는 특정한 숫자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저마다 선호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 길수라 부르는 숫자가 그것인데, 일반적으로 짝수에 비해 1, 3, 5, 7, 9의 홀수를 좋아하는 것은 동서양이 서로 다르지 않다. 정월 초하루(1. 1), 삼월 삼질(3. 3), 오월 단오(5. 5), 칠월 칠석(7. 7), 중양절(9, 9)의 예에서 보듯 홀수가 겹치는 날을 명절로 삼는 것은 홀수를 양으로 보는 동양의 음양설에서 기원한다. 최근 경제 문제에 사회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숫자 표시에 친숙하게 되었다. 주가, 환율, 부도 액수, 스포츠 스타의 연봉, 예산 규모 등의 숫자를 보면서 한결같이 놀라는 것은 액수가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한때 "윽"하고 기절할 정도로 억수로(억세게) 커 보였던 억대가 어느새 조대에 그 위력을 넘긴 지 오래다. 그러나 억조창생이라던 "억조"도 얼마 안 있어 조의 1만 곱절인 "경"이나, 거 나아가 경의 1만 곱절인 "해"에게 자리에 물려 주어야만 할 것 같다. 대국이라 그런지 중국은 수 단위에서 경, 해 말고도 자, 양, 구 등 10여 개의 더 큰 단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량수나 불가사의까지 동원해야 할 날이 머잖아 보인다.
사람은 예로부터 수를 헤아릴 때 바른손을 세우고 하나하나 차례로 손가락을 꼽아 나간다. "세다, 셈하다"라는 말 자체가 손가락은 세운다(립)는 뜻이며, "곱절"이라는 말도 손을 다시 꼬부려 꺽는다(꼽는다)에거 나온 말이다. 숫자 표시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다섯을 세면서 꼽았던 손가락이 모두 열리는(펴지는) "열(십)"에 이르면 벌써 많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럿"에서 보듯 "여러(열)"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는 뜻이다. 열이 다시 열 번을 거듭하면 더 많다는 뜻의 "온(백)"이 된다. "온 나라, 온종일, 온갖"등의 예에서 보면 "온"은 이미 숫자의 개념을 넘어 전부(전) 또는 영원을 지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와 발전으로 "온"도 결코 전부가 되지 못한다. 즈믄(천)이 생이고, 골(만)이 생기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자말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백번을 다시 백번 반복하면 이른바 "골백번"이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수치를 비처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앞서 손가락을 꼽고 펴는 동작에서 우리말의 수사가 생겼다고 했다. 손가락을 모두 꼽고 나면 이것이 다시 닫히는데, 이처럼 닫혔다 하여 "다섯"이란 말이 생겼다. "여섯"은 닫힌 손이 다시 열려 나가는 차례이며, 열에 둘이 없으면 "여덟"이요, 하나가 없으면 "아홉"이 된다. 다만 수의 출발점이 되는 "하나"만은 어원이 좀 별나다. 손꼽기 동작에서 유래한 말이 아니라 낟알, 곧 하나의 곡식 알갱이를 뜻하는 말이다. 부연한다면 "하나"는 "홑"과 "낟"이 합쳐진 말로서 홑은 홑이불이나 홀아비에서 보듯 겹이 아닌 단독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하나만을 손꼽기에서 차별화시킨 것은 하나의 수가 시작이기 때문이요, 또 곡식 한 알갱이도 귀하게 여기는 농경 사회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나(줄여서 "한") 곧 홑은 겹이 아니기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 이런 외톨이의 허전함을 두 번째 손가락 검지가 포근히 덮어 준다. 둘(이)운 "두블"의 준말로서 엄지를 꼬부린 그 위에 검지(인지)를 덮는 모습을 나타낸다. "덮다"를 옛말에는 "둡다"고도 했는데, 현대어의 "두텁다, 두께"등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할 때의 "더불다"도 여기서 파생된 말이다. 셋(삼)은 손가락 한가운데, 곧 "사이(새)"에 있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양쪽의 두 손가락들 사이에 위치하기에 한자어로 간지 또는 중지라고도 한다. 또한 이 가락은 다섯 가운데 가장 길기 때문에 길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서양에서의 "럭키 세븐" 7보다도 더 선호하는 숫자가 되었다. 무엇이든 세워 놓기 위해서는 최소한 발이 셋은 있어야 한다. 셋의 "세"와 서다, 세우다(립)의 "서, 세"가 결코 무관치 않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는 염불이 있는데, 이는 수리 곧 길상존을 세 번 연거푸 암송함으로써 모든 업을 씻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다. 삼각형의 안정된 기반 위에 하늘, 땅, 사람의 삼재와 삼계 및 삼위일체가 펼쳐지고, 하루 세 끼의 식사와 함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삼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가.
IMF 사태로 나라 살림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지만 우리는 결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삼세번이라는 그 세 번의 기회가 있는 만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손가락을 꼽으며 한 알 두 알 낟알을 모아 가노라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여겨지는 그 엄청난 빚도 언젠가는 갚을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니까.
|

가야와 가라홀
땅이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바탕말들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꼴과 뜻이 바뀌어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낯설 때도 많다. 옛나라 이름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많다. <삼국유사>의 ‘가야’ 쪽 기록도 마찬가지다.
‘수로왕’이나 ‘5가야’의 명칭은 모두 고유명사다. 이들 가야는 모두 ‘가라’ 또는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점에서 양주동이나 최남선은 ‘가야’의 어원을 ‘가람’과 관련지어 풀이한 바 있다. ‘가람’은 ‘강’을 뜻하는 옛말이다. 낙동강 하류의 여러 갈래마다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이름이 ‘가라’ 또는 ‘가야’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가람’이 낙동강에만 해당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병선의 <한국고대지명연구>에서는 <고려사>의 “간성현(杆城縣·강원도 간성)은 본디 고구려 수성현(守城縣)이었는데, 달리 말하기를 가라홀(加羅忽)이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부분이 보인다. 이를 따르면 ‘가라’는 중세어 ‘거록ㅎ.다’의 어원인 ‘거르다’ 또는 ‘기르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늘날 ‘길다’, ‘크다’의 뜻이다.
‘가라’를 ‘길다’와 연관지어 해석하고자 하는 논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가라’가 낙동강 유역의 나라 이름만으로 쓰이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를 고려한다면 ‘가야’에 들어 있는 ‘가르다’ 또는 ‘길다’와 같은 말들은 땅이름을 형성하는 기초 어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허재영/건국대 강의교수
서방과 사위
서방은 본디 ‘새 사람, 큰 사람’을 뜻하는 말로 본다. 흔히 아는, 글 읽는 방 또는 책방(書房·冊房)이 아니란 말이다. 정재도님은 ‘서’란 ‘사·소·솔·쇠·새’처럼 ‘ㅅ’ 계통 말로서 “새롭다, 크다”로, ‘방’은 “건설방(건달), 만무방(염치 없는 사람), 심방(만능 무당), 짐방(싸전 짐꾼), 창방(농악의 양반 광대)” 들의 ‘방’으로서 ‘房’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토박이말로 봤다.
성씨 뒤에 두어 사위·매제, 아랫 동서를 일컫거나 부르는 말로 쓰이고, 남편을 홀하게 일컬을 때도 쓰인다. 옛적에 책 읽는 선비보다 농투성이·장사꾼·사냥꾼·백정·광대·노비 … 들이 훨씬 많았고, 그들도 다 시집장가는 갔을 터인즉, 새 사람을 부르고 일컫는 말이 없을 리 없고보면, ‘서방’이 먼저고, 나중에 안다니들이 그럴싸한 문자(취음·書房·西房)를 끌어대어 퍼뜨렸을 법하다.
“서방맞다·서방하다·서방맞히다”는 시집가다·시집보내다·짝짓다는 말이다. 서방은 색시·각시와 맞서며, 서방질·계집질은 상스럽지만, 서방님이면 남편을 한층 높이는 말이 된다.
‘사위’는 예전엔 사회·사휘·싸회 …처럼 썼고, 사투리로는 ‘사오·사우’라고도 한다. 한자로는 서랑(壻郞) 여서(女壻) 질서(姪壻)의 ‘서’(壻)에 해당한다. 장인·장모는 사위를 ‘여보게!, ○ 서방!” 식으로 부르고, 글말로는 군(君)을 쓰며, 장인 사위 사이를 ‘옹서간’(翁壻間)이라 한다. 표준화법에서 사위는 아내의 어버이를 장인어른·장모님, 때로는 아버님·어머님으로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최인호/한겨레말글연구소장
마라초
담배는 아메리카가 원산지로 16세기부터 유럽에서 재배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7세기 초에 중국·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담배를 ‘서초’(西草), ‘남초’(南草), ‘왜초’(倭草)라 불렀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담배가 전래된 시기를 고려하면 기껏해야 1600년대라 하겠다.
필터 담배가 나오기 전에는 곰방대나 장죽과 같은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종이에 말아서 피웠다. ‘종이에 만 담배’를 ‘권연초·권연·지권연·궐련·궐련초·지궐련’이라 하는데, 이들 말은 일본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로 담배를 ‘煙草’로 적는데, 우리 한자음으로 읽으면 ‘연초’이고, 일본어로 읽으면 ‘타바코’다. 또, ‘종이로 감은 것’을 지권(紙卷)이라 하므로, ‘종이로 만 담배’는 지권연초(紙卷煙草)가 된다. 일본어에서는 ‘연초’에서 ‘초’만 생략한 줄임말을 쓰지 않는다. 발음이 ‘타바’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말에서는 ‘타바코’로 읽지 않고 ‘연초’로 읽으므로 ‘초’를 생략해서도 쓴다. ‘궐련’은 ‘권연’ 발음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권연, 지권연’은 우리말 방식의 줄임말이고, ‘궐련’ 등은 우리말로 바뀐 것이라 하겠다.
북녘말 ‘마라초, 만담배’는 궐련을 뜻한다. ‘필터가 달린 담배’를 북녘에서는 ‘려과담배’라고 한다. 남녘에서는 마라초를 피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담뱃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는 마라초 피는 이가 늘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김태훈/겨레말큰사전 자료관리부장
"정한수" 떠놓고…
멀리 나간 가족을 위해, 군대 간 아들을 위해, 병이 난 가장을 위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꼭두새벽에 우물로 나가 정성스레 떠온 맑은 물로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렸다. 이런 장면은 소설이나 노래 등에 많이 묘사되는데 대중가요 '전선야곡'에도 '정한수 떠다놓고 이 아들의 공 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란 구절이 나온다. 이때의 '정한수'는 정화수(井華水)를 발음에 이끌려 잘못 쓴 것이다. 한약재 복령(茯)을 '봉양'으로 잘못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화수는 새벽에 사람들이 긷기 전 처음으로 퍼 올린 우물물을 말한다. 이 물은 치성드릴 때만이 아니라 약을 달이거나 먹을 때도 쓴다. 우리 선조는 물을 수십 가지로 분류해서 썼다. 예를 들자면 정월에 처음 내린 빗물인 춘우수(春雨水), 가을철 이슬을 받은 추로수(秋露水), 휘저어서 거품이 생긴 감란수(甘爛水, 일명 百勞水), 순하게 흐르는 물인 순류수(順流水), 빨리 흐르는 여울물인 급류수(急流水), 황토로 만든 지장(地漿) 등을 용도에 따라 골라 사용했다. 이렇게 물의 종류를 나눠 용처를 달리한 옛 어른들의 발상이 재미있으면서도 놀랍다.
김형식 기자
정한수(X) 정화수(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