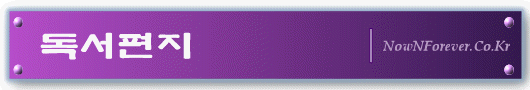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생활 속의 우리말
부위별 고기 명칭 - 아롱사태의 그 은밀한 맛
한국인처럼 쇠고기를 맛깔스럽게 양념하여 불에 구워 먹는 민족도 드물 게다. 쇠고기는 어느 한 부위도 버릴 곳이 없어 우리는 육류가운데서 최상으로 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상들은 각 부위별로 맛맛을 감별하고 거기에 맞는 독특한 명칭과 조리법을 개발해 놓았다. 이는 우리 민족이 수렵 생활에서부터 농경 생활을 거치면서 스스로 터득한 식문화 전통이다.육규 가운데 "불고기"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음식으로 여겼다. 그러나 생활 환경에 따라 입맛도 변하는지 "너비아니"라 일컫던 쇠고기 구이도 갈비에게 자리를 내주고 얼마 안 있어 갈비 역시 양념을 안 한 생갈비나 안심, 등심과 같이 좀 더 세분화된 부위의 독특한 맛에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는 전문화시대여서 쇠고기라도 다 쇠고기가 아니고 갈비라도 다 갈비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인간의 간사란 혀가 부위별로 다른 그 고유한 맛을 감지해 낸 결과라고나 할까.
"갈매기살"이라는 고기가 있다. 처음 이 명칭을 대했을 때 필자는 바다에 사는 갈매기를 구운 것이라 오해했다. "제비추리"도 마찬가지여서 "초리(추리)"가 꼬리를 뜻하는 옛말이니 요새 사람들은 갈매기뿐 아니라 제비의 꼬리까지 먹는 줄로만 알았다. 하긴 중국 요리에서는 까치집이나 상어 지느러미도 훌륭한 요리감이 되니 말이다. "도가니탕"도 오인하기에 좋은 이름이다. 흔히 쇠붙이를 녹여 내는 "도가니"에 넣고 끓인 고깃국이 도가니탕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가니는 사실 "무릎도가니"의 준말로서 소의 무릎에 붙은 종지뼈와 그것을 싸고 있는 살덩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말하자면 종지뼈의 형태가 마치 도가니의 그 우묵한 그릇 모양을 닮았기에 속된 표현이기는 해도 종지뼈 대신 도가니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갈매기살은 돼지고기의 가로막을 이루는 살 이름이다. 안창고기라고도 부르는 이 부위는 가로막았다는 "가로막살"이 줄어 갈매기살이 된 것이다. 앞서 제비추리의 추리는 꼬리의 옛말이라고 했는데, 쇠고기에서는 이 부위가 양지머리의 배꼽아래에 붙은 살코기를 가리킨다.쇠고기명을 떠나서 "제비초리"라 하면 사람의 뒤꼭지에 뾰족이 내민 머리털을 칭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묘하게도 모양이 흡사한 쇠고기 부위명으로 옮아갔다는 게 흥미롭다. 이처럼 고기의 부위별 명칭은 우리 고유어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움과 운치라는 맛을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고기를 다루던 백정이나 푸줏간 주인의 안목에 감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뼈다귀 해장국"이라는 식당 간판이 거부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뼈다귀를 "뼉다구"라고 쓰면 또 어떤가. 그것이 고유어기 때문에 결코 싫지 않게 느껴진다.
쇠고기는 맛의 차이에 따라 대략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 이를테면 안심과 등심은 상육으로, 갈비, 쇠악지, 업진, 대접삭, 양지, 채끝살, 우둔 등은 중육으로, 사태, 홍두깨살, 도가니, 꼬리, 중치, 살, 족 등은 하육으로 친다. 내장으로는 염통을 비롯하여 간, 처녑, 양, 콩팥, 허파, 곱창, 딸창, 곤자소니, 지라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선지, 쇠모리, 혀, 골, 등골, 주라통 따위를 들 수가 있는데,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가 소박한 고유어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옛날 천시를 받으며 살았던 백정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등심이나 안심이라는 말도 고유어로 보아야 한다. 사전에는 "심"을 한자"심"으로 적고 있으나 여기서 심은 힘(력)과 동일어로서 근육을 지칭하는 우리말인 것이다. 심은 심장이나 마음 또는 중심을 뜻하는 한자말인데, 안심은 몰라도 등심의 경우 소의 등에 심장이나 마음이 있을 리 만무하다. 힘은 추상어만이 아닌 구체어로서 근육을 뜻한다. 문헌에도 근을 "힘 근"으로 지칭한 만큼 안심은 "안쪽 힘살"을, 등심은 "등의 힘살"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다. 쇠악지, 업진, 채끝살, 딸창, 곤자소니 따위의 이름도 소박한 우리말이긴 하나 "아롱사태"나 "뭉치사태"의 멋진 표현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태"는 두 다리 사이를 지칭하는 "삿(삳)다리(샅타리)"가 줄어든 말이다. 씨름에서 사타구니에 매는 샅바를 상기헤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샅은 원래 사이(간)의 옛말인 "삿"에서 나온 말로 짐승에서 사태는 주로 국부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뭉치사태나 아롱사태는 무엇을 뜻하는가? 뭉치의 경우는 이 부위의 살코기가 뭉쳐겨 있다는 뜻일 텐데 아롱사태의 "아롱"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기는 하다. 그러나 아리송할 것 같은 이 말은 "아롱무늬"라는 말에서 본래의 뜻을 내보인다. 특히 그것이 점이나 무늬가 고르게 총총한 형상을 일러 아롱아롱 또는 아롱다롱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암소의 그 은밀한 부위에 아롱아롱 아름다운 무늬가 있기에 이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참나무 숯불로 쇠고기를 구울 때 지글지글 타는 연기 속에 밴 고기맛은 단연 일품이다. 갈비나 등심의 맛도 더할 나위가 없지만 아롱사태를 구워 먹는 그 맛은 또 어떠한가. 연한 고기맛도 맛이려니와 그것이 오묘한 부위라는 점에서 분명히 한 맛이 더한 것 같다. 아롱사태나 제비초리는 실로 고기맛보다는 고운 이름으로 하여 더 맛깔스럽다고 하겠다.
|

자주꽃방망이
방망이는 치거나 두드리는 데 쓰는 물건이어서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꽃방망이라고 하면 느낌이 확연히 달라진다. 예전에 아이들이 진달래, 싸리꽃 꽃가지를 여럿 꺾어 긴 막대기에 둥글게 묶어서 놀던 것을 꽃방망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나 아는 추억속 놀잇감이다. 40대의 갤러그, 30대의 테트리스, 20대의 스타크래프트, 10대의 닌텐도 …. 50년 안쪽 사이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확연히 바뀌었음을 실감한다.

‘자주꽃방망이’는 방망이 같이 쭉쭉 뻗은 단단한 줄기에 자주보라 꽃이 층층이 달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그야말로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방망이다. 백두산에서 피는 하얀 ‘흰자주꽃방망이’는 희면서 자줏빛이라니 모순된 이름이다. 그냥 ‘흰꽃방망이’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화관이나 꽃방망이 등 자연 장식이야말로 최고의 꾸밈이지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따서 꽂아두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지켜본다고 한다. 우리에겐 아름다운 이름 ‘꽃방망이’지만, 먹을 힘도 없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쓴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김혜자)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임소영/한성대 언어교육원 책임연구원
도라산역
도라산은 경기도 장단군에 있는 산이다. 장단군은 고구려 때 장천성현(長淺城縣)이었고, 조선 예종조에 이르러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도라산에는 고려 태조의 딸인 낙랑공주와 마지막 신라 임금 경순왕에 얽힌 설화가 있다. 나라를 잃은 경순왕이 늘 도라산에 올라가 경주 쪽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모습을 보고 낙랑공주가 영수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그를 곁에서 지켰다는 이야기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도라산은 임진 남쪽 25리에 있는 산이며, 북쪽 천수산과 동쪽 파주 대산을 잇는 봉수가 있었다고 한다. 임진을 중심으로 동으로 화장산, 서로 오관산, 남으로 도라산, 북으로 망해산이 둘렀으며, 그 산세는 둥그렇고 원만하게 생겼다고 기록한다. 둥그스럼한 산에 ‘도라’라는 말이 붙은 사례는 함경남도 단천의 ‘도라화산’도 있다.
‘도라’는 ‘돌다’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과 비슷한 형태로는 ‘두루’, ‘두리’가 있다. 지리산의 다른 이름으로 ‘두류산’이 있으며, 단천의 ‘도라화산’이 ‘두류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두류’의 이형태인 ‘두로’와 ‘두륜’도 산이름으로 널리 쓰인다. 이는 ‘돌다’와 ‘둥글다’가 관련이 깊은 까닭인데, 동사 ‘두르다’나 형용사 ‘두렷하다’도 둥근 모습과 관련이 있다. ‘도라’와 ‘두루’는 둥글고 원만한 모습의 땅이름으로 널리 쓰인 말들이다.
남북 철도 왕래가 시도되면서 경의선과 도라산역이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남북 열차의 도라산역 통과는 겨레의 둥글고 원만한 통일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허재영/건국대 강의교수

짝벗 일컫기
다른 언어에서도 짝벗(배필) 사이에서 부르는 안정되고 특별한 말은 드물다. 방향 정도나 애칭처럼 쓰이는 말뿐이다.(다링·디어·하니/영어, 아이건·롱롱/중국, 오마에·아나타/일본 …)
본디 부르는 말이 없는 게 자연스럽다고 할지라도, 서로 불러야 할 필요는 많다. 그 대안이 ‘애칭’이다. 실제 애칭을 만들어 쓰는 이도 적잖은 줄 안다. 우선은 자기들끼리 써서 편하게 통하면 된다. 나아가 숱하게 쓰긴 하지만, ‘여보’가 ‘여보시오’를 줄인 말이어서 재미 없다면 다른 말을 찾아 볼 수도 있다. “저(나) 좀 보아요”를 줄인 ‘저보’나 ‘나보’가 더 말맛이 난다면 ‘여보’를 제치고 애용될 수도 있을 터이다. 이쪽은 짝벗 사이 거리만큼 새말 깃발을 꽂을 여지가 많은 셈이다.
부르는 말이 안정되지 않은 만큼 짝벗을 일컫는 말도 다양하다. 남편이 아내를 제삼자 앞에서 “집사람·안사람·내자·마누라·아내·처 …”들로 일컫는다. 어버이나 동격 이상의 어른 앞에서는 ‘어미/에미·어멈, 그이, 그사람, ○○씨 …’들로 듣는이의 격에 따라 일컬음이 달라진다. 아내는 남편을 ‘바깥사람, 바깥양반, 밭사람, 그이 …’로 이른다. 어른 앞에서 ‘아비·애비/아범, ○ 서방 …’들을 써 왔고, 밖에서는 ‘우리 신랑, 저희 남편, 그이, 그사람, ○○씨 …’ 등 듣는이의 격에 맞춘 일컬음이 있다.
이 밖에 “철수야,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자네 오라버니도 올 때가 됐네”처럼 듣는 상대 기준의 호칭이나 걸림말을 받아 쓰는 방식이 제일 흔하고 편하며 무난한 것으로 친다.
최인호/한겨레말글연구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