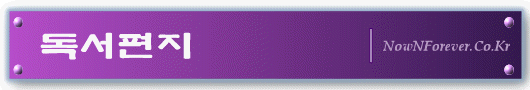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생활 속의 우리말
질병용어 - 든 병, 난 병, 걸린 병
연거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작을 일러 "들락날락, 들랑날랑" 또는 "들락대다, 들락거린다"고 한다. 도 드나들다란 말도 있어서 드나들면서 하는 고용살이를 "드난살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날랑들랑, 나락들락, 나들살이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나 들어옴(입)이 먼저요 나감(출)이 나중인 것으로 안 모양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모든 동작은 움츠린 데서,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차에서도 승객이 내린 다음에 타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한자어 출입도 고유어로 "나들이"라 하고, 외출할 때 입는 옷을 난벌, 집안에서 입는 평상복을 든벌, 그리고 이 둘을 겸하는 옷을 든난벌이 아니라 "난든벌"이라 한다. 이는 책상이나 장롱 따위의 서랍을 열고 닫는다하여 "여닫이", 빼고 닫는다 하여 "빼닫이"라고 이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출입을 뜻하는 나다(출)와 들다(입)가 이처럼 상반된 뜻이기는 해도 경우에 따라 비슷한 의미로 쓰일 때가 많다. "병이 나다"와 "병이 들다"라는 발병의 경우도 그런 예이다. 발병을 우리말로는 "병이 나다, 병이 들다, 병에 걸리다, 병을 얻다"등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동일한 뜻으로 보이는 이 말들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얼마간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우리말의 뛰어난 감각성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나 할까. 우선 병이 나다와 얻다를 하나의 의미군으로 묶고, 병이 들다와 걸리다를 따로 묶어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음미해 보기로 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가? "몸살이 걸렸다, 감기가 났다, 골병에 걸렸다, 성병이 났다, 에이즈가 들었다..." 큰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웬지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몸살은 발병 요인이 신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몸살이 났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골병도 그렇지만 고독이란 병, 누군가를 지독하게 짝사랑한 데서 비롯된 상사병도 같은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감기나 성병 또는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은 요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걸렸다, 들었다"고 해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그러고 보면 병이란 본래 나는 것이 들거나 걸리는 것보다 먼저인 모양이다. 몸살이란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신체의 군형이 깨어진 상태라서 이때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하면 그만 병이 들고 만다. 감기가 들거나 감기에 걸리는 것도 같은 상황이다. 또한 각종 전염병이나 외부에서 심한 자극을 받아 골병이 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이 드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지만 병에 걸리는 경우는 좀 성질이 다르다. "성병에 걸렸다, 에이즈에 걸렸다"에서 보듯 "재수 없게 걸린 것"만은 아닌, 자신의 과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럴 때는 "걸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달리 말하면 난 병은 과로에서 비롯된 것이요, 든 병은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은 물론 한자말이기는 해도 그 병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무엇인지 모를 만큼 질과 함께 우리말 속에 뿌리 내린 지 오래다. 우리말에서는 아마도 "앓다"나 "몸져눕다"라는 동사가 이를 대신하지 않았나 싶다. 앓다에 "ㅡ브다"라는 접미사가 연결되면 "아프다"라는 형용사가 된다. 이는 곯다에서 고프다, 낮다에서 나쁘다, 싫다에서 슬프다가 파생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한자말인 병이나 질도 본래 "병하다", "질하다"로 쓰인 것을 보면 병이나 질은 원래부터 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훈몽자회"에서도 질을 훈하여 "병할 질"로 적고 있다. 또한 "이 염병할 놈아!"라는 욕설에서 보듯 병은 "하다"란 접미사가 붙어 동사로 쓰였다. 이 "병하다"라는 말은 "치른다"라는 말로 발전한다. 옛날에는 일단 병이 걸리면 이와 싸워 이겨낼 수 밖에 없었으니 "앓다"라는 말보다 "치르다"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특히 한 번씩은 꼭 앓아야 했던 홍역 같은 병은 더욱 그러하다. 이울러 응당 치러야 할 병을 이겨낸 이들에게 과분한 찬사도 아끼지 않는다. "벼슬"이란 말이 바로 그것인데, 홍역을 치른 아이들에게 "큰 벼슬했구나!"하면서 위로함을 잊지 않았다. 그것을 치러내는 과정이 그토록 어려웠기에 "나도 큰 마마, 작은 마마다 치른 놈이라고!"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마마"란 천연두와 같은 역병을 두려워하여 붙인 말로서 이 두 가지를 이겨냈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벼슬을 한 셈이다.
인간의 병은 크게 보아 전염병과 성인병으로 나뉜다고 한다. 현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성인병이라고 하니, 곧 든 병이 아니라 난 병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정신계통의 신경성이 많다고 하는데, 요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만이 난병을 치유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무리하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해야 나는 병은 물론 들거나 걸리는 병까지도 막을 수 있다. 병이 난다는 말보다 병을 얻는다는 말이 더 높임말 같으나 병이란 본래 달갑지 않은 것이기에 아예 주지도, 얻지도 말아야 할 대상이다.
|

과메기
경북 남부 해안지방에서는 겨울철 별미로 과메기를 즐겨 먹는다. 추운 겨울에 날꽁치를 얼렸다 말렸다 하면서 만든 과메기는 이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 유명해졌다. 포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어르신들의 말로, 과메기는 본디 청어로 만들었는데, 청어가 귀해져서 꽁치로 만든다고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과메기’를 경북지방 사투리로서 ‘꽁치를 차게 말린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관목’(貫目)은 ‘말린 청어’라는 풀이와 함께 모든 사전에 올려놨다. 여기서 포항 고장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의 실마리가 잡힌다.
‘과메기’는 ‘관목’이 변한 말로 짚어볼 수 있다. ‘관목’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관목이’가 되고 다시 [ㄴ]이 떨어져 ‘과목이’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뒷모음 [ㅣ]가 앞모음에 영향(ㅣ모음역행동화)을 주어 ‘과뫼기’가 된다. 이런 현상은 우리말에서 자주 나타난다. ‘남비’가 ‘냄비’로 되는 따위의 음운현상이다. 그 다음 ‘과메기’로 형태가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때 이 말의 본고장인 포항에서조차 ‘과메기’냐, ‘과매기’냐 하는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었다. 귀로 이 두 발음을 골라 듣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관목’에서 추적하면 쉽게 해결된다.
산(山)의 우리말은 ‘뫼’였다. 이것이 오늘날 ‘메’로 바뀌었다. 멧돼지·멧새 등에서 보기를 찾을 수 있다. ‘뫼’가 ‘메’ 바뀌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과뫼기’는 ‘과매기’가 아니라 ‘과메기’로 되어야 할 것이다.
우재욱/우리말 순화인·작가
엉겅퀴
엉겅퀴라는 풀이름은 우선 예쁘지가 않다. 뭔가 엉켜서 퀴퀴한 습지에서나 자랄 것만 같은 어감이다. 그러나 여름에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자라는 자주보라색 꽃은 개성 만점이다. 특히 통모양의 작은 꽃들이 모여 한 송이 꽃을 만드는 것은 나비나 벌이 꿀을 한꺼번에 많이 따가게 하려는 배려라고 한다.
‘엉겅퀴’라는 이름은 피를 엉기게 하는 성질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넘어지거나 칼이나 낫에 베어 피가 날 때 엉겅퀴를 찧어 바르면 금방 피가 멎는다는 것은 옛사람들의 생활 상식이었다. 1690년에 나온 <역어유해>에 이미 ‘엉것귀’라 나와 있는데, 이는 엉기다와 엉겅퀴의 한자말 귀계(鬼?)의 ‘귀’가 합쳐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다. 곧, ‘엉기는 귀신풀’ 정도의 뜻이 된다.
키가 크고 가시가 많아 ‘항가시나물’, ‘가시나물’이라고도 한다. 큰 것은 1m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때 크다는 뜻의 ‘한’이 ‘항’으로 변한 것이다. 톱니잎의 가장자리가 모두 가시로 되어 있어서 찔리면 따끔거린다. 한자말로는 빛이 붉어 ‘야홍화’(夜紅花), 약이름으로는 ‘대계’(大?)라 이른다.
임소영/한성대 언어교육원 책임연구원,

[엉겅퀴]
오랫도리
옛날 서적을 읽다 보면 오늘날 쓰지 않는 말들이 나타날 때가 적잖다.〈열녀춘향수절가〉에서 이도령이 천자문을 읽자, 방자가 한 마디 던진다. “여보 도련님, 점잖은 사람이 천자는 또 웬일이오?”, “소인놈도 천자 속은 아옵네다.” 그러고는 “높고 높은 하늘 천, 깊고 깊은 따 지, 홰홰 칭칭 가물 현, 불타것다 누루 황”이라고 읽는 모습은 가히 웃음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은 한문 공부의 첫걸음이라고 할 ‘천자문’ 풀이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라 문’이다.
홍양호의 〈북색기략〉에는 함북 방언에 문(門)을 뜻하는 ‘오라’가 있고, 덕(德)을 뜻하는 ‘고부’(高阜)가 있다고 한다. 함북 방언은 조선 초기 육진을 개척할 때 경상도 사람을 이주시켰으므로 신라 고어라고 할 수 있다. 황윤석은 영남 인본 천자문을 바탕으로 ‘오라’가 영남 고어라고 하였고, 객사에서 아이들이 대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도 풀이하였다. 이처럼 ‘문’을 ‘오라’로 풀이한 예는 더 발견되는데,〈석봉 천자문〉의 ‘오라 문’이나,〈소학언해〉의 ‘문 오래며 과실 남글’[門巷果木]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 김윤학 교수 연구에서, 강화 화도면에 ‘오랫도리’라는 밭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한 동네 들머리에 놓인 이 밭을 ‘출입문에 해당하는 밭’이라고 생각하며 ‘오랫도리’라 불렀다는 것이다. ‘도리’는 ‘둘레’란 뜻이므로, ‘동리로 드는 문의 주위에 놓인 밭’이다. 땅이름에 우리말이 화석처럼 깃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허재영/건국대 강의교수
|
|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가슴 찡한 이야기 - 황지니
하늘나라에 교실을 짓자꾸나!
폴란드의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이 나타나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유태인 앞에 드디어 독일군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의 일부는 마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학교로 와서 학생 중에 드문드문 섞여 있는 유태인 어린이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독일군의 모습을 본, 가슴에 별을 단 유태인 어린이들은 무서워서 선생님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코르자크란 이름을 가진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온 유태인 어린이들을 두 팔로 꼭 안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아이들을 왜 잡아가느냐고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짐승만도 못한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팔에 더욱 안타깝게 매달였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야."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서 유태인 어린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군인을 막아서며, "가만 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무섭지 않지?"
"네,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라 트럭에 올랐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독일군이 선생님을 끌어내리려 하자,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이 어린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오" 하며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마침내 트레물렌카의 가스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꼬옥 잡고 앞장서서 가스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유태인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 함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학살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워진 기념관 뜰에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견고한 탑은 부서지지만 위대한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Strong towers decay, But a greatname shall never pass away. (P. 벤자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