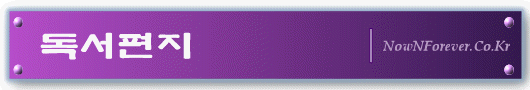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생활 속의 우리말
부모 호칭어 - 엄마, 아빠에서 "어이 어이"까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일까? 생전 처음 입 밖으로 내뱉는 이 최초의 말이 죽으면서도 남기는 인류 최후의 언어가 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의문에 대해 희랍의 사가 헤로도투스는 매우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옛날 이집트의 한 왕이 새로 태어나는 자신의 아이를 대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무슨 말을 내뱉는가를 관찰하게 했다. 전혀 언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말이 인류 최초의 언어, 곧 조어일 것으로 가정했던 것이다. 그 결과 "베코스"라는 제일성을 듣게 되었고, 이 말이 소아시아의 한 지방 언어인 프리지안 어(phrysian)로서 빵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이 기록은 그저 흥미있는 일화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언어가 다름 아닌 빵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서양인의 구호가 생각난다. 이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이나 한국인에게는 "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에 해당되는 말이다. 빵이나 밥은 먹을 것을 가리키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한 본능이다. 그런데 이 본능적 욕구, 즉 먹을 것을 요구하는 외침이 친족 호칭어의 기본인 부모 호칭어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더욱이 이런 현상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한국의 아이들도 태어나면서 "맘마, 밥바"를 외치면서 부모를 찾고 먹을 것을 요구한다. 맘마, 밥바에서 첫소리 자음 "ㅁ" 과 "ㅂ"이 떨어져 나가면 "엄(암)마, 압바(아빠)"가 되고, 이것이 바로 부모를 부르는 말의 기원어가 된다. 부모 호칭에서도 어머니를 칭하는 말의 첫음이 "ㅁ(m음소)"이며, 아버지를 칭하는 말의 첫음이 "ㅂ(f, v)"임도 역시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우리말의 어미, 아비, 어머니, 아버지 등이 모두 부모 호칭의 기원형인 "엄" 이나 "압"에서 분화, 파생된 어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비, 할미는 이 기원형에 크다는 뜻의 "한"이 접두하여 발음하기 쉽게"할"로 바뀐 것이다. TV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태종의 세자 양녕대군이 할아버지인 태조를 향해 "할바마마"라고 무르고 있음을 본다. 오빠 및 올케라는 호칭도 아버지의 기원형 "압"에서 분화된 파생어이다. "오라비"는 아비에 "올"이 접두한 어형이고, 올케도 "오라비겨집"이 줄어든 말이다. "올"은 올벼, 올감자 등의 예에서 보듯 어려서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지칭하므로 올아비 역시 어린 아버지란 뜻이다.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아우라는 호칭은 본래 "아시"에서 "ㅅ"이 탈락한 형태로 지금도 동생을 낳을 때 경상도에서는 "아시본다"는 말을 쓴다. 아시는 작다, 어리다는 뜻인데, "아시아비"가 줄어 아재비로, "아시어미"가 줄어 아재미 또는 아주머니라는 파생어를 만든다. 말하자면 부모 항렬이긴 하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저씨나 아주머니의 어원을 유별나게 보려는 사람도 있다. 곧 아저씨는 "아기의 씨"를 가진 남자이고,아주머니는 "아기의 주머니"를 가진 여자라는 것이다. 이는 우연히 어형이 유사한 것으로 그저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부부를 지칭하는 지아비, 지어미 역시 부모칭의 압, 엄에서 짓는다(작)라 할 때의 "짓"이 접두한 말이다. 농경사회에서 부부를 생산자로 여겨 그렇게 부른 것이다. 말 그대로 부부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집을 짓고, 밥을 짓고, 농사를 짓고, 옷을 짓고, 자식을 짓는(자식 농사란 말이 있다)일에 종사하는, "짓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후레자식"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흔히 아비 없이 자란 아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홀어미 자식"을 이르는 말로 지아비가 없다 보니 제대로 자식을 짓지 못하여(교육을 시키지 못하여) 버르장머리없는 자식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말의 친족 호칭어도 여느 어사처럼 극심하게 한자저의 침투를 입었다. 친근한 고유어를 버리고 한자어를 쓰게 된 것은 맹목적인 한자 숭상의 사대풍조와 함께 한자어가 가지는편리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옛 문헌에서는 외숙모를 가리켜 "어미오라비겨집"이라 하고, 이모부를 가리켜 "어미겨집동생의 남진"이라는 긴 이름으로 적고 있다. 이처럼 우리말이 촌수에 비례하여 길어지는 단점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가까운 피붙이의 호칭이 이보다 더 정겨울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부모칭 외의 아들, 딸, 언니, 누이, 며느리 등도 이에 해당하 한자어가 있기는 하나 고유어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비집고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우리말이 지닌 그 피붙이(혈연)와도 같은 친근감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낳아 주고 길러 준 부모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기를 맞았을 때 서양인들은 "오 마이 갓!" 하며 하느님을 찾지만 우리는 "엄마야!" 하며 부지불식간에 어머니를 찾는다. "어머나, 어마나, 에그머니나, 오매" 등도 모두 같은 유형이다. 통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어이 어이"하면서 슬프게 곡을 하는데, 이때 "어이"는 단순히 울음의 의성어가 아니라 어버이를 부르는 말이다. 어떤 이는 "어이"가 부모 가운데서도 특히 어머니를 가리키므로 "어이 어이"하는 곡성은 모태회귀 본능의 발로라 주장하기도 한다.
어떻든 부모칭은 태어나 맨 처음 배우는 말인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되뇌는 삶의 최종 언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모칭이 먹을 것을 찾는 본능적 의사 표시에서 기원했다는 점에서 "엄마, 아빠는 우리의 밥이다."라는 말도 가능할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의 이런 노골적 표현이 일견 고약스럽기는 하지만, 부모들은 어차피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기에 그리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

저 같은 경우는?
흔히 쓰이는 이상한 말투 가운데 ‘~ 같은 경우는’이란 익은말이 있다. 이 말투는 삽시간에 널리 퍼져 일반 대중의 말뿐만 아니라 방송 진행자들의 말까지 흐려놓고 있다.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전문 방송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말투가 일반화돼 있다.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조금만 눈귀를 기울이면 이런 말투를 거의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부도가 난 어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부채 같은 경우는’, ‘자본금 같은 경우는’ 하면서 말을 이어나간다. 그냥 ‘부채는’, ‘자본금은’ 하면 잘 간추려진 말인데, 공연히 군더더기를 붙여 뒤틀어 놓고 있다. 외제 상품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에서는 잘 팔리는 외제 상품을 들추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다. 담배나 자동차가 특히 많이 팔려서 다른 외제 상품과 차별화하고자 그런 표현을 썼다면 몰라도, 단순히 여러 가지 외제 상품을 나열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다. 여기서도 그냥 ‘담배는’, ‘자동차는’ 하면 될 일이다.
우리말에 이런 쓰임새의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정 상황을 공유하는 집단을 뭉뚱그려 이를 때 이런 말을 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도둑을 욕하더라도, 굶기를 밥 먹듯 해 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저 같은 경우’는 ‘저’ 말고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어 온 여러 사람을 뭉뚱그려 이른 것이다.
우재욱/우리말 순화인·작가
족두리꽃
칠월 하늘 아래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족두리꽃을 보았다. 집 둘레에 흔하게 심는 꽃이 아니어서 지나는 이마다 임자에게 꽃이름을 물어본다. ‘족두리꽃’이라고 하니, 애써 전날 여자들이 쓰던 족두리에 견준다. 그러고 보니 예저기 핀도 꽂혀 있고, 새색시 머리에 얹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모양에 크기다. 다른 야생화 ‘족두리풀’의 자주 꽃도 족두리를 닮아 붙인 이름인데, 그 족두리는 고상하고 얌전하게 생겼다. 북한에서는 ‘나비꽃’이라고 하는데, ‘조선말대사전’에는 분홍과 흰색의 나비 모양 꽃이 핀다고 설명한다. 역시 나비 날개와 더듬이를 떠올려 본다. 한자말로도 바람에 나는 나비 모습이라고 ‘풍접초’(風蝶草)라 한다.
족두리꽃은 지금 딱 칠월만큼 진하고 예쁘다. 다른 나라에 살면서 날씨는 늘 쾌적하고 이파리들은 언제나 푸르지만 잎사귀의 짙어짐을 거의 체험할 수 없는 평균적 푸름이 왠지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그래서 신록이 있고 녹음이 우거지고 처연히 단풍 드는 우리 땅이 문득 문득 그립다는 친구의 말이 떠오른다. 사람도 자연도 확실히 ‘다이나믹 코리아’임이 틀림없다!
임소영/한성대 언어교육원

[족두리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