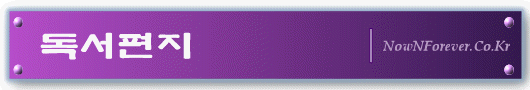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 일본식 용어 -
일본식 / 우리식
나병환자 / 용천뱅이, 문둥이
낙서(落書) / 장난글씨
남성기(男性器) / 숫부끄리, 숫불이틀, 외눈박이, 기름공이, 풋망이
납득(納得) / 이해(理解)
납치(拉致) / 거납(去拉), 납거(拉去)
낭하(廊下) / 복도, 골마루
내신(內申) / 속사리
내역(內譯) / 명세(明細), 속가름(「가름」은 분석 또는 해석이라는
뜻이니, 「속가름」은 곧 내용을 해석한다는 말임)
내제자(內弟子) / 무릎제자(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가르친 제자)
내홍(內紅) / 내분(內紛)
노동자(勞動者) / 일꾼
노숙(露宿) / 한둔, 한뎃잠
노점(露店) / 한뎃가게
노파심(老婆心) / 지나친 걱정
논리(論理) / 신론(申論)
농로(農路) / 사랫길(논밭 사이로 난 길)
농악(農樂) / 풍물(風物)
뇌물(賂物) / 화뢰(貨賂)
다분(多分) / 아마
다완(茶碗) / 공기, 찻종
단배식(團拜式) / 시무식(始務式)
담당자(擔當者) / 맡은이, 빗아치
답신(答申) / 대답사리
답절(踏切) / 건널목
당뇨병 / 소갈질(消渴疾)
당분간 / 아직, 얼마간, 얼마 동안
대개(大槪) / 거반, 거의
대변(大便) / 똥, 말, 큰것, 대마
대본(貸本) / 세책(貰冊)
대본서점(貸本書店) / 세책점
대세(大勢) / 여럿, 흐름
대절(貸切) / 독세
대절차(貸切車) / 독세차, 독차
대점포(貸店鋪) / 셋가게
대지(大地) / 곤여(坤輿)
대질(對質) / 면질(面質)
대합실(待合室) / 기다림방
도락(道樂) / 오입(誤入), 소일(消日)
도약(跳躍) / 몽구르기(멀리 또는 높이 뛰기 위하여 두 발을 모두어
힘차게 뜀, 또는 어떤 일을 하려고 벼르거나 굳게 마음 먹음), 몽그림
도제(徒弟) / 계시 : 바치쟁이(기술자)가 자기의 바치(기술)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 젊은 사람을 가려
뽑아 일터로 데리고 다니면서 바치를 가르쳐 주는데
그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도중(途中) / 중로(中路), 노상(路上)
도화사(道化師) / 어릿광대
독신(獨身) / 홑손
동경일백칠십도팔부 / 동경일백칠십도팔분
동맥(動脈) / 날핏대
동맹(同盟) / 결맹(結盟)
동면(冬眠) / 겨울잠
동물(動物) / 숨탄 것:「숨을 불어넣음을 받은 것」이라는 뜻으로,
사람을 비롯한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
동반(同伴) / 작반(作伴), 작려(作侶), 동행(同行)
두취(頭取) / 행수(行首), 장(長)
등급(等級) / 등분(等分)
등산(登山) / 입산(入山)

도내와 섬안
해안 지방이 아닌 곳에 ‘섬’과 관련된 땅이름이 붙어 있음은 특이한 일이다. 경북 문경 가은읍의 ‘도내’(島內)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도리’(島里) 들이 그렇다. 이런 땅이름은 ‘섬’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섬’을 뜻하는 한자 ‘도’(島)가 쓰인 까닭은 뭔가?
내륙 쪽에 나타나는 ‘섬’과 관련된 땅이름은 대체로 굽이진 강물과 관련이 있다. 달리 말해 ‘도내’나 ‘도리’는 굽이진 강의 안쪽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여기서 ‘도’는 ‘돌다’라는 뜻을 지닌다. 곧 물이 돌아 흐른다는 뜻의 ‘도는 마을’이라는 말이다. ‘도는 마을’은 ‘돌말’이라는 합성어를 이루기도 하며, ‘돌내’나 ‘도내’로 굳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도’에 해당하는 한자인 ‘도’(島)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다시 우리말로 옮기면서 ‘섬안’이라는 땅이름까지 나온다.
이처럼 ‘도내’가 ‘섬안’으로 변하게 되면, 왜 이런 땅이름이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돌이 거의 없는 곳인데도 ‘돌머루’라는 땅이름이 생기거나 ‘석천’(石川)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한다. 심지어는 복숭아 산지도 아닌데 ‘도내’(桃內)라는 한자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 또한 ‘섬안’이나 ‘석천’이 생성되는 원리와 같다. 영월군 주천면의 ‘도천’(桃川)은 후삼국 때 ‘도내부곡’(刀乃部曲)이었다. ‘도내’가 ‘도천’으로 바뀌고서, 조선 선비 성임이 신선의 복숭아를 따서 임금께 바치고 장수를 빌며 신선 만나기를 축원했다는 얘기가 덧붙은 것은 자연스런 일인 셈인가?
허재영/건국대 강의교수
우리말의 짜임새와 뿌리
지금까지 ‘말겨레’란 문패를 달고 세계 여러 말의 뿌리와 짜임새를 살펴봤다. 어떤 말들은 짜임새가 비슷하면서도 뿌리가 다른 것도 있었고, 짜임새는 조금 다르지만 뿌리가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말의 뿌리와 짜임새는 어떤가?
흔히 우리말의 짜임새 특징을 교착어라 한다. 교착어란 문법 형태소를 하나씩 덧붙여 문법 관계를 표현하는 말을 일컫는다. ‘할아버지께서 오시었다’란 말을 보면, ‘할아버지’에 ‘께서’가 붙어 높임의 주격을 보이고, ‘오시었다’의 ‘오-’에 ‘-시-’가 붙어 주어를 높이는 기능을, ‘-었-’이 붙어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을, ‘-다’가 붙어 서술문이라는 기능을 보인다. 일본말·터키말·몽골말·핀란드말 따위도 비슷한 짜임새다. 말차례도 ‘주어+목적어+서술어’로 짜였는데, 위에 든 말들도 대개 그러하고, 이란말·힌디말·벵골말 따위도 우리와 말차례가 같다.
우리말의 뿌리는 어떠한가? 대체로 알타이 말겨레에 든다고 한다. 알타이 말겨레에 드는 몽골어파, 만주퉁구스어파, 터키어파와 같은 계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외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비교언어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리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말겨레에 드는지는 앞으로 좀더 깊고 폭넓은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와 이웃한 말들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비교해 보는 한편, 우리의 값진 언어유산인 지역말들을 늦기 전에 빠짐없이 조사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권재일/서울대 교수·언어학
넋살탕
‘넋이 나갈 정도의 호된 골탕’을 ‘넋살탕’이라 한다. 넋살탕이라는 말은 ‘넋살’과 골탕의 ‘탕’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넋살탕은 ‘먹다’와 함께 관용구 ‘넋살탕을 먹다’로 쓰인다. ‘넋살탕을 먹다’는 ‘넋살을 먹다’, ‘넋을 먹다’로 써도 비슷한 뜻이 된다. 모두 ‘호되게 당하여 겁을 먹다’의 뜻이다.
“맹사격에 행군의 일선에 섰던 적 토벌대들이 넋살탕을 먹고있었다.”(조선말대사전)
“우리의 명중사격에 넋살을 먹은 적들은 (…) 내빼기 시작하였다.”(조선말대사전)
넋은 정신적인 것이므로 보통 ‘나가다’와 같이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을 뜻하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 그런데 ‘먹다’는 밖에서 안으로의 이동을 뜻하므로 정신이 위축되는 것, 곧 ‘겁을 먹다’의 뜻이 되었다. ‘넋’을 ‘놓다, 뽑다, 잃다, 나가다, 빠지다’와 함께 쓰면 ‘정신이 나가다’의 뜻이 되고, 넋살을 ‘내다’와 함께 쓰면 ‘몹시 혼나게 하다’, 넋살을 ‘나다, 떨어지다’와 함께 쓰면 ‘몹시 혼나다’의 뜻이 된다. 여기서 ‘혼나다’는 ‘넋이 나갈 만큼 놀란 상황이다’, ‘넋이 나갈 만큼 시련을 당하다’는 뜻이다. ‘혼나다’는 ‘혼이 나간다’, ‘넋이 나간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혼나다’는 넋살과 관련 없이 ‘꾸지람을 듣다’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 연유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넋이 나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넋살은 〈조선말대사전〉에서 ‘넋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했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넋의 잘못’으로 풀이했다.
김태훈/겨레말큰사전 자료관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