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세계 문학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을 읽는 한 가지 키워드를 그의 소설 『단식광대』를 통해서 찾아보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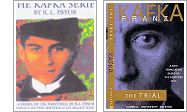 카프카가 살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소설이 가장 번성하는 시대였다. 그때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읽기’라고 하는 탐식증이 있었다. ‘소설읽기’라는 탐식증은 독자들의 끊임없는 읽을거리에 대한 욕망과 작가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에 따른 결과였다. 카프카가 살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소설이 가장 번성하는 시대였다. 그때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읽기’라고 하는 탐식증이 있었다. ‘소설읽기’라는 탐식증은 독자들의 끊임없는 읽을거리에 대한 욕망과 작가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에 따른 결과였다.그래서 작가는 계속해서 ‘읽을’ 음식을 제공해줘야 했고, 읽을거리가 제공되려면 그걸 쓰기 위해서 일종의 굶기가 이루어졌다. 프루스트는 “나는 굶어죽지만 대신 태어나는 게 소설이다.”, “나는 엄마벌이다. 나는 가만히 있고 결국 내 작품이 내 등허리를 파먹고 대신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먹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욕망에 가장 충실한 행위가 아니다. 먹기야말로 가장 철저하게 질서화 되어있고, 가장 철저하게 문화화 되어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먹기의 질서는 언어처럼 이미 법칙화 되어 있다. 자유로운 제도화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된 것은 ‘먹기’ 가능하지만, 비제도화 된 것은 ‘굶기’, 즉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식광대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제도화된 ‘먹기’를 거부하고 ‘굶기’를 했던 것은 비제도화 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였다. |
 소설(한 작가가 이야기로 꾸며서 이야기로 만든 글)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상으로서 상상적인 것(The imaginative)과 이것을 얘기하는 도구로서 언어(The symbol), 그리고 이야기가 실제로 도달하고자 하거나 혹은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대상(The real)들 간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한 작가가 이야기로 꾸며서 이야기로 만든 글)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상으로서 상상적인 것(The imaginative)과 이것을 얘기하는 도구로서 언어(The symbol), 그리고 이야기가 실제로 도달하고자 하거나 혹은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대상(The real)들 간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단식광대가 먹고 싶어 했으나 끝끝내 먹지 못한 ‘맛있는 음식’은 소설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얻기 위해 단식광대가 실행한 ‘굶기’라는 방법론은 소설이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실체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에 비교 된다. 그런데 먹기라는 것이 음식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듯이, 언어도 의미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언어는 의미가 주어짐으로써 의미현상이 된다. 그러나 제도화된 의미법칙에 따라 표현되는 언어는 그것이 배제하고 있는 실체를 표현할 수 없고, 표현된 것은 단지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단식광대가 기존의 음식 중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먹기’를 포기하고 ‘굶기’를 행하여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게 됐듯이, 카프카는 ‘의미 굶기’를 통해 제도화 된 의미법칙에서 배제된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결국 ‘의미’의 거부가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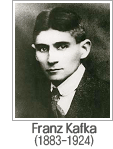 카프카의 소설 『단식광대』에는 단식예술가가 나온다. 그는 철망 안에 들어가 짚을 깔고 앉아 있다. 그리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구경한다. 그 앞에는 팻말이 있고, 며칠째 굶고 있다고 매일 쓰여진다.
카프카의 소설 『단식광대』에는 단식예술가가 나온다. 그는 철망 안에 들어가 짚을 깔고 앉아 있다. 그리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구경한다. 그 앞에는 팻말이 있고, 며칠째 굶고 있다고 매일 쓰여진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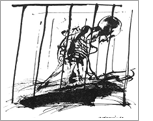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단식이라는 행위가 더 이상 유행이 아니게 됐을 때, 그는 홀로 서커스단에서 여전히 굶기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단식을 할거냐”는 감독의 질문에, 그는 “단식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없어서 단식을 한다”고 답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식광대가 죽고, 그 자리는 무엇이든 잘 먹는 표범이 차지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단식이라는 행위가 더 이상 유행이 아니게 됐을 때, 그는 홀로 서커스단에서 여전히 굶기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단식을 할거냐”는 감독의 질문에, 그는 “단식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없어서 단식을 한다”고 답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식광대가 죽고, 그 자리는 무엇이든 잘 먹는 표범이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