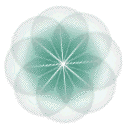|
작은 이야기 2 - 정채봉, 류시화 엮음
1. 평범한 행복 2
나의 행복은 걷는 것 - 김용택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 강가나 논두렁 밭두렁 도랑가에 새로 많은 꽃들이 피어난다. 그중에서도 처서 무렵에 피는 꽃은 구절초이다. 구절초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꽃이 꽃의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 꽃이 필 때쯤이면 하늘은 높아지고 곡식들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햇살은 멀어지고 바람은 산들거리기 때문이다. 또 그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가을 꽃들이 연달아 피어나기 때문이다. 물가나 물기 있는 곳에 오불오불 피어 있는 고마리라는 꽃밭은 나를 참으로 들뜨게 한다. 아무 쓸모도 없는 풀이고 누가 예쁘라 꺾어 가지도 않지만 물기 있는 곳에 밭을 이루는 고마리 꽃밭은 나를 기쁘게 한다. 어디 고마리꽃뿐인가. 도랑가 도랑물을 따라 쭉하니 피어 있는 물봉숭아꽃은 또 얼마나 곱고 예쁜가.
나는 학교까지 걸어서 다닌다. 빨리 가면 한 35분쯤 걸리지만 천천히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40분이나 50분이 걸릴 때도 있다. 아침밥을 먹고 논과 밭 사잇길로 걷다가 두 개의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옛날에 내가 걸어서 학교까지 가면 만나는 친구들이나 어른들은 일을 하시다 말고 "어이 김 선상, 자전거를 사지 그려"하곤 했다. 또 얼마쯤 오토바이가 유행되니 사람들은 또 "어이 김 선상, 오토바이라도 사지 그려"하곤 하더니 몇 년 전쯤, 아니 2년여 전만 해도 "어이 김 선상, 차를 사지 그려"하면 그냥 나는 빙긋이 웃거나 "젊은 다리니까 그냥 깐닥깐닥 걷지요, 뭐"하곤 했다. 나도 한때는 자전거로 다닐 때도 있었지만 너무나 집까지 빨리 와버려 재미가 없어 그냥 이웃집 조카를 줘버렸다. 그 뒤로는 자전거를 사본 적이 없다. 외지에서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도 차를 사라거니, 오토바이를 사라거니 하면 나는 그냥 너무 빨리 학교에 가고 너무 빨리 집에 오니 재미가 없다고 한다. 너무 빨리 집에 오는 것이 재미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웃는다.
지금은 어찌어찌해서 아내와 아이들은 전주에 가서 살고 나는 산중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랑 같이 이 집에 살 때 내가 학교에서 깐닥깐닥 걸어오면 아내는 아이를 업고 꼭 마중을 나오곤 했다. 해설픈 길, 아내와 내가 나란히 서서 걷는 맛이란 참으러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같이 걸어오면서 가을이면 가을꽃, 봄이면 봄꽃들을 꺾어다 내 방에 꼭 꽂아 두곤 했다. 내가 걷는 것에 맛을 붙인 것은,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걷는 것'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하는 것은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보는 자연의 온갖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휙휙 지나가면 지금 길가에 논두렁에 논과 밭에 무슨 꽃이 피어 있고 무슨 곡식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머르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보며 걷다 보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것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길가로 흐르는 물에 발을 적시고, 이슬에 신발이 다 젖는다. 눈이 오면 눈보라를 피해 커다란 느티나무 등 뒤에 몸을 감추고 눈보라를 피하며 숨을 돌리곤 한다. 추울 땐 씩씩하게 걸으면 이마에 땀이 솟는다. 나는 여지껏 내복을 입어본 적이 없다. 바람 없이 눈이라도 들판 가득 펑펑 내려 봐라. 집에 가기가 아까웁고 혼자 들길을 걷기가 아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볕 좋은 봄날 보리밭가 논두렁에 쭈그려 앉아 눈곱만하게 피어나는 풀꽃들, 쑥쑥 자라나는 보리들, 어느것 하나 내 눈길을 잡지 않는 것이 없다.
해뜨면 해를 등지고 걸어가 학교에서 생활하다 해지면 해를 등지고 집에 걸어온다. 꽉찬 푸르고 노란 들판, 서리가 하얗게 깔린 들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그러나 알게 모르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과 행복함은 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휙휙 지나며 보진 못하리라. 요즈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산도 한 30년쯤 바라보아야 산이다. 걸으면서 산을 보는 그 행복이 나를 이 산중에 잡아 둔다." (시인)
강아지 장례식 - 김선희
며칠 전 해질 무렵, 공연히 짜증이 나고 울적해 변두리 지역의 야산에 올라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언덕 저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그쪽으로 가봤더니 열 살 가량의 사내아이가 조그만 꽃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고, 그 옆에 일곱 살, 다섯 살쯤 먹어 뵈는 계집아이 둘이 무언가를 함께 안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그들의 대화를 들어 보았다.
"얘들아, 이제 땅을 다 팠으니까 뽀삐를 묻자."
땅을 파던 사내아이가 말하자 조금 큰 계집아이가 대답하였다.
"아냐,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데 어떻게 묻어? 우리 이렇게 보듬고 있다가 차게 식으면 묻자, 오빠야 응?"
사뭇 애원하는 투였다.그러자 쪼그리고 앉아 있던 가장 어린 계집아이가 말했다.
"그럼 식지 말라고 내가 옷으로 싸줘야지."
그리고는 계집아이는 입고 있던 제 웃옷을 벗어 안았던 것을 돌돌 감아 주었다. 그것이 죽은 강아지였음을 안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이 각박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저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체온이 남아 있는 강아지가 땅속에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말이다. (회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