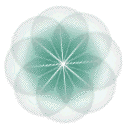|
사랑할 땐 별이 되고 - 이해인
구슬비 시인
- 권오순 선생님께
송알송알 싸리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긋웃는 꽃잎마다 송송송
고이고이 오색실에 꿰어서
달빛새는 창문가에 두라고
포슬포슬 구슬비는 종일
예쁜구슬 맺히면서 솔솔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리 자주 불렀던 이 맑고 고운 노래말은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더 자주 흥얼거리게 됩니다. 이원수 선생님이 열다섯 살에 쓰셨다는 `고향의 봄`과 권오순 선생님이 열여덟 살에 쓰셨다는 `구슬비`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모두의 정겹고 소중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작품뿐 아니라 삶 자체가 그대로 은구슬, 옥구슬 같았던 권오순 마리아 선생님, 일생을 수녀처럼 사신 선생님. `언제 다시 찾아뵈어야지`하고 벼르던 중에 선생님이 임종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받고 보니 `구슬비`의 밝은 노래말도 오늘은 슬프고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40kg도 채 못되는 가냘픈 몸으로 평생 신앙에 의지하고 동시만을 써오신 선생님. 불편한 다리와 병약한 몸으로 1948년 단신 월남한 후,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의 염원으로 눈물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선생님의 그 해맑은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몇 년 전 제가 충북 제천 백운리 성당 뒤, `선생님의 꽃숲 속의 오두막집`을 방문했을 때는 너무 반가워 어쩔 줄 모르시며 맛있는 점심도 차려 주셨지요. 꽃들이 가득한 정원의 성모상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도 다시 들여다봅니다. 마음처럼 자주 방문은 못했어도 종종 편지를 올리며 어쩌다 고운 우표라도 몇 장 넣어 보내면 소녀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전 괴팍하리만치 남의 도움을 원치 않는 성격이지만 향그러운 고마음 깊이 간직할게요. 사진, 상본, 우표들 모두 감사했어요. 이곳은 산골이라 기념우표 구하기도 어려워 겨우 몇 장에서 꼭 하나 남은 것을 수녀님 편지에 썼었는데...얼마나 기뻤는지 눈물날 정도였어요. 감히 바라지 못했던 만남의 기쁨으로 다녀가신 날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철부지인 듯해요. 이런 건강 상태로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이 철부지인 듯해요. 평생의 소원인 통일! 비록 제 발로 고향 땅을 못 가보더라도 통일에의 서광만이라도 알고 죽는 게 소망이라 했더니...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시나 봅니다.`
선생님의 음성이 살아나는 듯한 편지들을 읽으며 추억에 잠겨 보는 저녁입니다. 짬짬이 예비자 교리도 하고, 집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흰구름골의 거처를 떠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평화모후원` 양로원에 들어가신 후, 선생님은 나날이 더 약해지시고, 독방이 아니기에 글도 마음껏 쓸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지요.
`...한평생 고독을 즐기며 외롭게 자유롭게 살아오다가 생활이 달라지니 아직 얼떨떨하기만 해요. 오랫동안 정든 흰구름골 오두막을 떠나올 때는 참으로 서운해 눈물겹기도 했지만 이 생활에 적응해 선종 준비나 잘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작품집을 출간하려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지는 북녘하늘이나 우러러봐야겠지요. 지난 여름 오시어 기념사진 남긴 것이 새삼 감사할 뿐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추억의 보석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수원의 `평화모후원`에 들렀을 때 선생님은 자꾸만 제게 무얼 해주고 싶어 하시기에 하얀 손수건에 손생님의 솜씨로 들꽃을 수놓아 주십사고 부탁드렸습니다. 몇 주 후에 선생님은 갖가지 고운 꽃을 수놓고 제 빨래번호인 88번 숫자까지 곱게 새긴 다섯 장의 손수건을 정성껏 포장해서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석 장은 아껴 두고 두 장을 번갈아 가며 쓰고 있는데 그 손수건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선생님의 겸손한 삶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길로 떠나시고 나니 이 손수건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미리 부탁드리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수건 위의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선생님의 `풀꽃`이란 동시를 읊어 봅니다.
탐스럽게 크고
화사하진 못해도
장미처럼 곱고
예쁘진 못해도
파란하늘 한 웅큼
품은
하늘색 꽃이게 해주세요
이름은 없어도
하늘색 꽃이면 그만이어요
이젠 그토록 좋아하시는 하늘색 꽃이 되어 하늘나라로 떠나신 마리아 선생님, `구슬비`의 시인 선생님. 선생님을 부르면 늘 즐겨 입던 고운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 미소를 보내실 것만 같습니다. `구슬비`를 애창하던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수녀가 되어 그 노래말의 주인이신 선생님을 만나 뵙고 구슬비처럼 맑고 고운 정을 나눌 수 있었음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인연이며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비록 저 세상으로 떠나셨어도 아름다운 `구슬비` 노래 속에 동심으로 이어지는 기도 속의 만남이 있기에 슬픔 중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구슬비` 선생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