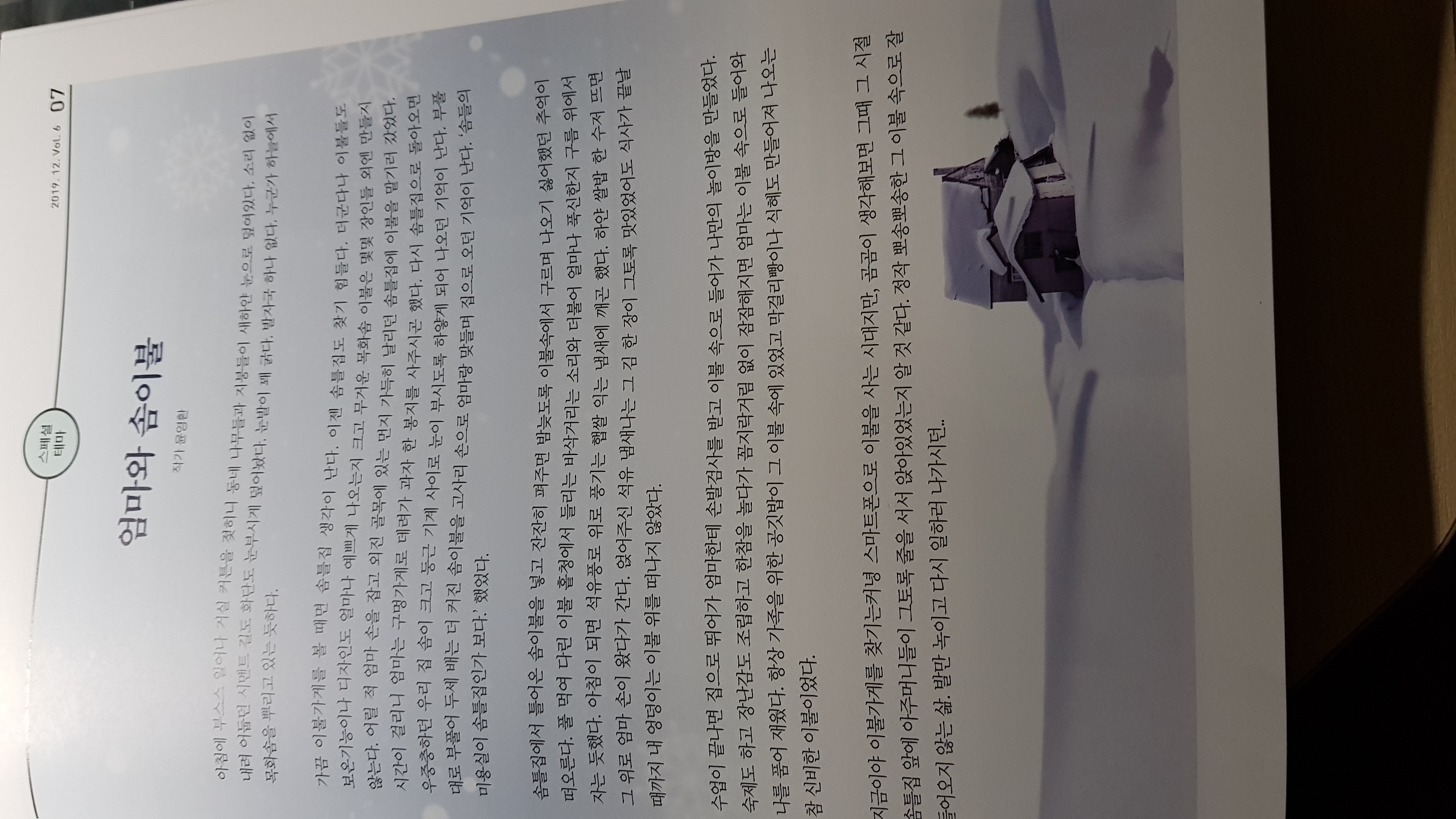|
|
엄마와 솜이불
아침에 부스스 일어나 거실 커튼을 젖히니 동네 나무들과 지붕들이 새하얀 눈으로 덮여있다. 소리 없이 내려 어둡던 시멘트 길도 화단도 눈부시게 덮어놨다. 눈발이 꽤 굵다. 발자국 하나 없다. 누군가 하늘에서 목화솜을 뿌리고 있는 듯하다.
가끔 이불가게를 볼 때면 솜틀집 생각이 난다. 이젠 솜틀집도 찾기 힘들다. 더군다나 이불들도 보온기능이나 디자인도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크고 무거운 목화솜 이불은 몇몇 장인들 외엔 만들지 않는다.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외진 골목에 있는 먼지 가득히 날리던 솜틀집에 이불을 맡기러 갔었다. 시간이 걸리니 엄마는 구멍가게로 데려가 과자 한 봉지를 사주시곤 했다. 다시 솜틀집으로 돌아오면 우중충하던 우리 집 솜이 크고 둥근 기계 사이로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되어 나오던 기억이 난다. 부풀 대로 부풀어 두세 배는 더 커진 솜이불을 고사리손으로 엄마랑 맞들며 집으로 오던 기억이 난다. ‘솜들의 미용실이 솜틀집인가 보다.’ 했었다.
솜틀집에서 틀어온 솜이불을 넣고 잔잔히 펴주면 밤늦도록 이불속에서 구르며 나오기 싫어했던 추억이 떠오른다. 풀 먹여 다린 이불 홑청에서 들리는 바삭거리는 소리와 더불어 얼마나 푹신한지 구름 위에서 자는 듯했다. 아침이 되면 석유풍로 위로 풍기는 햅쌀 익는 냄새에 깨곤 했다. 하얀 쌀밥 한 수저 뜨면 그 위로 엄마 손이 왔다가 간다. 얹어주신 석유 냄새나는 그 김 한 장이 그토록 맛있었어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내 엉덩이는 이불 위를 떠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뛰어가 엄마한테 손발검사를 받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나만의 놀이방을 만들었다. 숙제도 하고 장난감도 조립하고 한참을 놀다가 꼼지락거림 없이 잠잠해지면 엄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나를 품어 재웠다. 항상 가족을 위한 공깃밥이 그 이불 속에 있었고 막걸리빵이나 식혜도 만들어져 나오는 참 신비한 이불이었다.
지금이야 이불가게를 찾기는커녕 스마트폰으로 이불을 사는 시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 솜틀집 앞에 아주머니들이 그토록 줄을 서서 앉아있었는지 알 것 같다. 정작 뽀송뽀송한 그 이불 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 삶. 발만 녹이고 다시 일하러 나가시던 엄마 생각이 난다. 스르르 잠들던 이불 속 엄마 냄새가 그리운 목화솜 내리는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