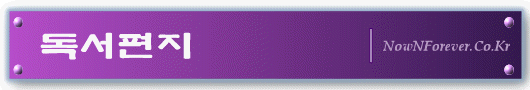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서산과 태안반도 - 서해 낙조에 어리는 백제의 미소
해안선 따라 천삼백 리, 태안반도는 지는 해를 보기 위해서라도 가볼 만한 곳이다. 일출의 눈부신 화려함이 동해의 맛이라면 일몰의 은은한 적막감은 이곳 서해의 맛이다. 학암포의 학바위에서나 안면도의 방포 해변에서 조망하는 낙조가 고즈넉하고, 불타던 노을이 재로 식어갈 무렵 달빛 속에 어리는 간월도의 풍정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간월도는 이름 그대로 달을 감상하는 섬이다. 섬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섬은 조선조 이태조를 도와 왕사가 된 무학대사에게서 이런 멋진 이름을 얻었다. 달빛 속에 비치는 이곳 풍경을 보면서 우리네 속인들은 가벼운 탄사를 발하지만 그 옛날 무학은 도를 깨쳤다고 한다.
무학대사의 "무학"을 무학이라 적기도 하는데, 이는 더 이상 배울게 없다는 뜻, 또는 전혀 배운바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후세인은 이 스님의 출생전설을 염두에 두었음인지 무학으로 적기를 좋아한다. 무학은 이 고장 보월리의 학돌재에서 태어났다. 스님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라에 진 빚을 갚지 못하여 도피하자 어머니가 대신 옥에 갇히게 되었다. 온 천지가 눈으로 뒤덮인 추운 겨울날, 끌려가던 어머니는 산기를 느껴 눈 속에 해산을 하고 옷가지로 아기를 덮어 놓은 채 현청까지 따라갔다. 뒤늦게 사정을 안 현감은 산모를 풀어주었는데 아기를 되찾은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두 마리 학의 보살핌속에 잘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춤추는 학, 곧 무학은 어머니가 지어 준 이름이고, 학이 아이를 돌본 고개, 곧 학돌재는 이 고을 사람들이 지어 준 출생지의 지명이다. 간월암, 간월도의 풍정이 그토록 깊고 그윽했던 것도 이곳이 바로 오도의 섬이어서 그랬던 모양이다.
간월도 지척에 섬 아닌 또 하나의 섬이 남북으로 길게 누워 있다. 그곳은 섬 전체가 온통 솔 내음으로 그득한 안면도, 지명 그대로 편안히 잠든 형상이다. 뒤틀리고 외틀어진 소나무만을 보아오던 우리의 눈에 죽죽 미끈하게 뻗은 이 섬의 홍송은 마치 슈퍼 모델을 보는 듯하다. 조선조 때 황월장봉산이라 하여 왕실의 관을 짜는데만 쓰였다는 소나무 숲은 안면도의 중심지인 승언리에 이르면 절정에 달한다.
솔 내음에 취해 승언리 옆에 있는 "젓개(방포)" 포구로 나가면 탁트인 바다와 그 가운데 우뚝 솟은 두 바위섬이 우리를 반긴다. 할아비바위와 할미바위라 불리는 이 두 바위섬에는 애틋한 부부애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 때 청해진을 거점으로 당시 해상을 주름 잡던 장보고는 이곳 견승포(지금의 안면도)에 전진 기지를 두고 승언이라는 장수를 이 섬의 책임자로 삼았다 한다. 승언은 미도라는 아내와 함께 견승포를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날 출전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만다. 해변에 나와 남편을 기다리던 미도는 그 자리에 선 채 굳어져 할미바위가 되었고, 그 후 시신으로 귀환한 남편도 아내 곁에 서서 할아비바위가 되었다. 망부암이라 할까, 어떻든 바위이기는 하나 금슬 좋은 부부상이기에 보면 볼수록 정겹게 여겨진다. 남편 승언의 이름을 이 고을 읍소재지의 지명으로 삼은 것도 부부애를 기리기 위함이리라.
안면도는 태안반도 끝에 붙은 "태안곶"으로서 본래는 섬이 아니라 뭍의 일부였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의 이여송 장군이 이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을 경계하여 지맥을 끊고자 일부러 섬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삼남의 조세물을 배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곳으로 물길을 트고자 섬으로 만들었고, 훗날 그곳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다시 뭍과 이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안면소를 설치한데서 지금의 이름이 생겼지만,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문제로 그 이름처럼 편안하지 못했다. 한국 소나무의 정정함을 보기 위해서도, 또 그윽한 솔내음과 모감주나무의 향내를 맛보기 위해서라도 안면도는 언제까지나 편히 잠자는 섬으로 남아 있었으면 한다.
크게 편안하다는 태안, 그 태안반도 해안은 빼어난 경관과 함께 포도송이처럼 줄줄이 해수욕장을 매달고 있다. 북단 학암포에서 남단 영목항에 이르기까지 무려 서른개가 넘는 해수욕장이 자연 경관 못잖게 저마다 아름다운 이름을 뽐내고 있다.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연포, 몽산포, 꽃지, 바람아래등 어느것 하나 멋지지 않은 이름이 없다.
용이 승천할 때 큰 바람과 함께 조수가 일어 조개바람과 모래둑이 형성되었다는 "바람아래"해수욕장에서는 지금도 바람의 여신이 포근히 포구를 감싸 주고 있다. 만리포는 옛날 중국 사신을 전송할 때 수중만리 무사항해를 기원한 데서 유래했지만, "만리포 사랑"이라는 유행가가 나온 이래 청춘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포구가 되었다. 인근에 있는 연포도 마찬가지, 본래 솔개가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연포라 명명되었으나, 이후로 연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자연스레 연인의 포구, 곧 연포가 되고 말았다.
태안반도는 서해안에서 먼 옛날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해상의 통로였다. 백제때는 당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불교문화를 받아 들였고, 개화기 때는 천주교의 유입과정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린 곳이기도 하다. 당진은 당과의 교류에서 얻어진 이름이요, 태안과 서산의 두 마애불과 맑디 맑은 절집 개심사도 그 길목에 새겨진 교류의 흔적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야산 중턱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미소는 언제나 우리를 웃음짓게 한다. 서산마애삼존불, 곧 암벽에 새겨진 세 분의 부처님의 미소는 인도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닌 백제인의 미소, 바로 우리 한국인의 미소를 보여주고 있다.

[서산 마애삼존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