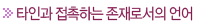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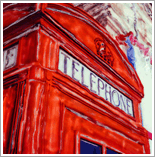 전화에서 들려오는 한 친구의 말은 존재로서의 언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마치 그 친구의 전체 존재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언제 만나자는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일종의 공동존재를 형성한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인간을 가깝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언어는 내가 타인에게 던지는 하나의 제스처다. 나는 말로 타인과 접촉한다. 말하자면 언어는 내용 그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며, 타인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 바로 공동존재를 구축하는 길이다. 친구와 나 사이의 공동적인 존재의 형성은 말을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한 친구의 말은 존재로서의 언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마치 그 친구의 전체 존재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언제 만나자는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일종의 공동존재를 형성한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인간을 가깝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언어는 내가 타인에게 던지는 하나의 제스처다. 나는 말로 타인과 접촉한다. 말하자면 언어는 내용 그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며, 타인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 바로 공동존재를 구축하는 길이다. 친구와 나 사이의 공동적인 존재의 형성은 말을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말라르메는 화요일마다 쉬었다. 당시는 사교가 모두 살롱에서 이루어지던 시대. 말라르메의 화요모임에는 그를 추종했던 발레리나 지드도 참석했다. 이러한 후배가 들어오면 말라르메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은 말라르메에게 감동을 받긴 했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말라르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말이 의미를 벗어나서 공동존재를 구성하는 작용에 집중된 것이다. 그게 바로 시다. 실제로 말라르메는 시가 그냥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음악이거나, 불꽃놀이거나, 발레리나의 움직임이기를 원했다. 또한 의미가 초과된 곳에서, 의미를 넘어선 곳에서, 이 세계의 규정화를 넘어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음악이 되기를 원했다. 말라르메에게 시의 이상적인 형태는 음악이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말라르메는 화요일마다 쉬었다. 당시는 사교가 모두 살롱에서 이루어지던 시대. 말라르메의 화요모임에는 그를 추종했던 발레리나 지드도 참석했다. 이러한 후배가 들어오면 말라르메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은 말라르메에게 감동을 받긴 했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말라르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말이 의미를 벗어나서 공동존재를 구성하는 작용에 집중된 것이다. 그게 바로 시다. 실제로 말라르메는 시가 그냥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음악이거나, 불꽃놀이거나, 발레리나의 움직임이기를 원했다. 또한 의미가 초과된 곳에서, 의미를 넘어선 곳에서, 이 세계의 규정화를 넘어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음악이 되기를 원했다. 말라르메에게 시의 이상적인 형태는 음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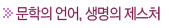
친구와의 전화를 통한 접촉 속에서 의미를 초과하는 터치, 일종의 리듬, 어떠한 율동이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 이러한 제스처란 어떤 극단적인 상황, 말하자면 전화를 하는 등의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세계에서 자연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자, 즉 의식의 죽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 앞에 처한 자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어떤 고통 앞에 노출된 자의 제스처가 바로 문학의 언어다. 문학의 이런 급진적이고 강렬한 제스처, 죽어가는 자의 손짓, 죽음에 다가간 자의 어떤 절규...이런 것이 없다면 문학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 제스처는 음악이 되어야 하고, 춤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문학 언어의 정상, 최고의 성취가 있다. 진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학은 과학과 철학을 따라갈 수 없다. 문학이 추구하는 정념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 텍스트 안에는 누군가의 현전이 있다. 문학의 언어는 결코 체화된 관념을 전달하는 진리의 언어, 지식의 언어가 아니다. 문학은 원초적인 생명의 제스처, 에로티즘의 제스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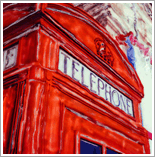 전화에서 들려오는 한 친구의 말은 존재로서의 언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마치 그 친구의 전체 존재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언제 만나자는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일종의 공동존재를 형성한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인간을 가깝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언어는 내가 타인에게 던지는 하나의 제스처다. 나는 말로 타인과 접촉한다. 말하자면 언어는 내용 그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며, 타인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 바로 공동존재를 구축하는 길이다. 친구와 나 사이의 공동적인 존재의 형성은 말을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화에서 들려오는 한 친구의 말은 존재로서의 언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마치 그 친구의 전체 존재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언제 만나자는 정보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일종의 공동존재를 형성한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인간을 가깝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언어는 내가 타인에게 던지는 하나의 제스처다. 나는 말로 타인과 접촉한다. 말하자면 언어는 내용 그 이전에 하나의 사건이며, 타인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 바로 공동존재를 구축하는 길이다. 친구와 나 사이의 공동적인 존재의 형성은 말을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말라르메는 화요일마다 쉬었다. 당시는 사교가 모두 살롱에서 이루어지던 시대. 말라르메의 화요모임에는 그를 추종했던 발레리나 지드도 참석했다. 이러한 후배가 들어오면 말라르메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은 말라르메에게 감동을 받긴 했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말라르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말이 의미를 벗어나서 공동존재를 구성하는 작용에 집중된 것이다. 그게 바로 시다. 실제로 말라르메는 시가 그냥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음악이거나, 불꽃놀이거나, 발레리나의 움직임이기를 원했다. 또한 의미가 초과된 곳에서, 의미를 넘어선 곳에서, 이 세계의 규정화를 넘어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음악이 되기를 원했다. 말라르메에게 시의 이상적인 형태는 음악이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던 말라르메는 화요일마다 쉬었다. 당시는 사교가 모두 살롱에서 이루어지던 시대. 말라르메의 화요모임에는 그를 추종했던 발레리나 지드도 참석했다. 이러한 후배가 들어오면 말라르메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사람들은 말라르메에게 감동을 받긴 했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말라르메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말이 의미를 벗어나서 공동존재를 구성하는 작용에 집중된 것이다. 그게 바로 시다. 실제로 말라르메는 시가 그냥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음악이거나, 불꽃놀이거나, 발레리나의 움직임이기를 원했다. 또한 의미가 초과된 곳에서, 의미를 넘어선 곳에서, 이 세계의 규정화를 넘어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음악이 되기를 원했다. 말라르메에게 시의 이상적인 형태는 음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