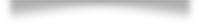우리말의 상상력 1 - 정호완
6. 가루와 분절
6-1. 겉치레
밖에 드러나는 모습은 부드럽고 안으로는 굳센 경우를 '외유내강(外柔內剛)'이라고 한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냉철하게 대하는 것을 이르는 교훈이 담긴 말이다. 물론 의도적으로 안과 밖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밖이 형식이라면 안은 내용에 해당한다. 안과 밖은 언제나 함께 있기 마련인데 밖에만 치중하여 꾸밀 경우를 보고 겉치레한다고 한다. 옛말에서는 밖이 '밧(능엄),' 혹은 '받(소해)'으로 쓰이었다. '밧(받)'이 '밖'으로 바홴 것이다. '밧'에서 비롯된 형태를 보면 흥미롭다. 입고 있었던 옷올 벗을 경우에 옛말로는 '밧다(((초두해), s-47)' 또는 '벗다(용가 36)' 로 샜으니 '밧/벗'은 넘나들엇다. '밧'은 '발' 의 의미로도 쓰였으니, 그러면 '밖'을 의미하는 '밧'과는 어떤 유연성이 있는 걸까. 생각건대, 발로 걸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돌아 다닐 수가 있다는 데 근거하지 않을까. 분화과정에서 '밧>발'로 됨은 'ㄷ>ㄹ'의 유음화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밧가락 (법화, 4-141), 밧목((구급방)하 26) 등] 친구 사이에 가면을 쓰지 말고 벗으라고 하는 수가 더러 있다. 가면을 '벗다', 이는 짐작하건대, 안과 밖이 다르다는 가정 아래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내어 놓으라는 말이다. 그럼으로써 밖과 안을 일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옷을 벗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밖에 걸치던 옷을 벗으면 속옷이 나오니 안이 곧 밖이 되는 게 아닌가. '바꾸다'와는 또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바꾸다'는 엣말로는 '밧고다(원각), 상 1-2 : 135)' 였다 한마디로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물건을 드러내 놓고 교환하는 동작을 뜻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바꾸다'는 어떤 자리나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면 똑같이 '밖'을 뜻했던 옛말 '받'은 어떻게 되 었을까. 받아들이고, 받들고, 받치고 할 때의 '받다'와 어떤 의미상의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자기 소유 밖으로 내놓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받게된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을 때 잘 모셔야[奉]한다는 것이 사회 관습이다. 상대방과 생각이나 힘이 같아서 맞부딪히면 맞대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말에서 '밧(ㄱ)[外]' 과 관계되는 낱말겨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밧(ㄱ)' 의 날말겨레(중세어)
밧(ㄱ) ((월석), 1-9), 밧겻(바깥 ; ((어록), 17), 밧고다(능엄) 2-I3), 밧기다(벗기다 ; (용가) 58), 밧나라(ㅎ) (외국 ; (삼역) 3-10), 밧니기 (밖걸기 ; (한청) 117 a), 밧다(받다 ; (한청) l74 b),밧도리 (바깥둘레 ; (노해)하 32), 밧번던(外舊鎭 ; (어제소학언해),6-90), 밧삼다(셈 밖으로 치다 ; ((초두해,, 16-l8), 밧장조아리(한청), 222 d), 밧집 鄕((훈몽)중 55), 밧쳔량(外財 ; (월석) 18-31,밧치다(받치다 ; (한청), 291 b), 밧침 ((역해 보), 41), 안밧(박해),상 61) 등.
'밧(ㄱ)' 의 낱말겨레(현대어)
1) 받-'계-받다, 받들다, 받들어총, 받아넘기다, 받아들이다, 받아쓰기, 받침, 받히다 등.
2) '밖-'계-밖, 밖에, 안팎 등.
'밧->받-' 과 '밧(ㄱ)>밖' 등 두 가지 계열이 생긴 것은 음소인식에 변이를 가져와 변별적으로 씀으로써 오해 었이 더 많은 어휘를 생성헤 낼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밧'이 중세어에서 지녀야했던 의미변별의 부담이 줄어지면서 별개의 의미소를 분화시켜 나간 셈이다. 밖과 안은 불가분의 것이니, 참으로 밖이 튼튼하고 안이 견실하다면, 무슨 일에서든 종은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을 것이다.
6-2. 굳음과 곧음
무른 땅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아주 여물고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굳은 땅에 물이 괸다' 고 하여 절약하는 사람이 재산을 모으고 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땅이나 사물의 견고한 상태를 '굳다'고 한다 땅이 '굳다'고 할때의 '굳' 은 (훈몽자회)와 같은 자료에서는 굴[穴] 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고대인은 오랫동안 굴에서 살아 왔다. 너무 물러서 흐트러지는 '굳'에서는 살 수가 없고, 견고한 토질이나 암벽으로 된 '굳'이라야 생활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굴/굳'은 여문 땅이거나 암벽으로 둘러싸인 곳에다 건조한 경우가 많다. 굳은 곳은 한번 잡힌 모양이 무른 데에 비하여 비교적 변하지 않고 늘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곧다'는 그러한 '굳'의 성질에서 비롯된 '굳다'가 모음의 바찝으로 갈라져 나온 말이라고 본다. 곧음과 굳음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두 형태의 음절구조는 'ㄱ十모음+ㄷ'이다. '굳다'와 연관되어 쓰이는 말에는 '구덕구덕 (물기가 약간 마른모양), 구두쇠, 굳이, 굳은 돌, 굳히다, 구덩이, 구덥다(아주 미덥다), 구들, 구들돌' 등이 있다. '구들'에 대하여 좀더 풀이하자면, 방의 바닥으로서 진흙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일컬은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곧다'와 관련되어 쓰이는 것으로는 '고두밥(된 밤), 고들고들(물기가 적어서 된 모양), 꼬드러지다(말라서 뻣뻣하게 된 모양), 곧다, 곧이, 곧이곧대로, 곧이곧솔(곧이곧대로의 방언), 곧이 듣다, 곧추, 곧추다'와 같은 꼴들이 있다. 사물의 상태가 변함없음을 '곧다' 라고 하고, 여기에서 유추하여 직선과 같이 변화가 없는 모양을 이를 때도 쏜다. 반대로 구부러진 것은 변화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성품이 정직한 상태를 '곧다'라고 함도 굴절됨 없이 변함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고치다'도 형태 바뀜의 속을 들여다보면 '곧十히 +_다>곧히다>고치다'로서,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즉 가변적인 것을 불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고침' 이니,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가변적인 것은 틀린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그러면 중세어에서 '굳'을 중심으로 하는 낱말의 겨레에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한다.
'굳-/곧-' 계의 낱말겨레 (쫑세어)
1) '굳'- 계_굳(굴 ; (월 인), 60), 굳다((용가), l9), 굳ㅂㄹ다(구급간), 1-19), 굳세다((유합), 하 2), 굳이 (소해 2-50) 등.
2) '곧'_.계_곧다(석보), 19-7), 곧티다(소해), 2-61) 등.
현대어보다 어휘들이 짧게 쓰임이 눈에 띈다. 중세어에서 종성의 변이로 말미암아 '곧>골((석보, 6-4), 굳>굴 ((유합), 하 56)' 의 과정을 거침은 홍미롭다. 골은 ㅅ(시옷)을 더하여 꼴(形 ; (월석) 8-28)' 이 되며 굴은 '꿀" ((훈몽), 중 2l)' 로 가지 벋어 나아간다.
6-3. 가까움과 가장자리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라고 한다. 가깝다고 마구 대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나빠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에서 노여움난다'고 함도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속담으로 보인다. 거리나 시간이 멀지 않거나 친족관계로 보아 8촌 이내로 당내에 속할 경우 흔히 '가깝다'고 한다. 옛말에 가깝다는 '갓갑다(월석), 2-50)' 로 표기된다. 갓갑다의 변이형태로는 '갓갑다((한청), 264 b)'가 있으며 같은 뜻으로 쓰인다. 갓갑다의 형태를 풀어 보면 '갓'에 접미사 '-갑다'가 붙은 것이다. 결국 '갓/갓'은 동사의 어근으로서,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갈라져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공간적으로 가장 밀접해 있으며,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이자 처음이기도 하다. 또한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것은 가장 멀다. 사람의 계획에 비유하자면, 목적을 달성해 내기까지의 역경이라고나 할까. 모음이 바뀜에 따라서 '갓' 은 '긋(끗) (청구), p. l14, (한청),32 d)' 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긋은 다시 받침이 변동되어 '굳/긋/ㄱ'으로 가지 벋어 나아간다. '갓/긋/끝/궂'계에 드는 것에 '가깝다, 가까스로, 가꾸러지다[머리를 가꾸로 박음으로써 땅 표면(끝. 경계 선)에 닿게 하는 것], 가쁘다(힘에 겨워 어렵고 괴롭다), 가장 (제일 먼저), 가장자리, 끗끗이 (끝내). 끝마치다, 끝막다(어떤 일의 끝을 내어 더할 나위가 없이 하다), 끝빨다(끝이 뾰족하다), 끝장(일의 마지막 결과), 끝전 (끝돈), 끝판(일의 마지막 판), 긋다(줄을 치거나 금을 그리다, 비가 잠깐 그치다, 쉬다, 끊다)'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 이것들은 '가깝다'의 어근형인 '갓/긋/귿/궂'의 뒤에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나 합성어들이다.
'가(갓)[邊]'의 방언분포를 살펴 보면, 가(ㅅ) (층남 천원.아산. 당진 서산. 예산. 청양. 서천 부여. 논산. 대전. 대 덕), 갓(제주전역), 가상(전북 무주 김제 부안. 임실. 정읍. 순창/전남 장성. 곡성. 구례. 광주. 나주. 순천 여수 고홍. 강진), 가생이 (경기 여주/충남 연기. 공주. 홍성. 보령. 대전 대덕 금산/전북장수. 남원/전남 구례/경남 밀양. 산청), 가싱이 (경남 창녕), 가서리 (경북 예천), 가상다리(전남 담양. 보성. 장흥. 강진), 가상사리 (층북 단양) 등이다. 이들 방언의 형태를 보면, 점미사 '-앙,/-앵이/_잉이/_어리 (_아리)'가 어근에 붙어 파생되어 나아간다.
시작이 곧 끝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물의 가장자리는 다른 사물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이니 처음과 끝은 사실상 상대적인 인식의 차이임을 알겠다.
6-4. 느리광이
평소 느릿느릿 움직이며 일만 하는 소도 상항에 따라서는 공격과 방어의 본능을 드러내는 일이 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도 화를 낼 때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좋은 비유이다. 행동이 느린 사람을 '느리광이'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빠르지 못하거나, 꼬임이나 조임의 정도가 성근 모양을 '느리다'고한다. 옛말울 더듬어 보면 느리다는 '날외다(초두해), 16-65), 날회다((초박해), 75)' 라는 말로 드러난다. 느리다는 개념은 공간지각으로 보아 '너르다'와 서로 그 맥을 같이 하며, 공간의 연장을 바탕으로 한다. 지금도 강원. 층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널을 '늘' 이라고 한다. 너르다와 느리다는 '널/늘'에서 파생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날'은 앞에 든 예와 같이 중세어에서 '날'로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필자는 '날'이 기역(ㄱ)곡용을 하던 말이 아닌가 한다. 결국 '날'계의 원형적인 어근은 '날(ㄱ)_' 로 볼 수 있다. '날(ㄱ)' 에 접미사 '_다'가 붙은 '낡다'는 '늙다'와 서로 모음의 대립을 보이면서 앞의 것은 사물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삭아 헐어지는 것을, 후자는 나이가 들고 오래된 상태를 이른다.
지금도 방언에서는 '늘고대기 (늙은 소의 평안도 방언), 늘구다(늘리다의 함경도 방언)'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국어의 변천과정으로 볼 때 '날구다(늘구다)'의 '날구(늘구)-' 가 어말모음의 탈락올 따라서 '낡(늙)-'으로 바뀌어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럼 '날구'는 무엇인가. 오늘날, 함경도 방언에서는 강의 나루를 '날구'라고 하거니와, ' 날구'에서 'ㄱ'이 떨어져 '나르'가 되고 이것이 다시 어말의 모음이 바뀌어 '나루'가 된 것이다. 강이나 바다의 좁은 목에다 배가 건너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일정한 곳을 나루라고 하거니와 나루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아 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때로 사람들은 좁은 도랑이나 구덩이와 구덩이 사이에 널을 놓아 건너 다닌다.
늙음의 본바탕은 낡아 가는 것이다. 즉 매가 나루에서 물의 흐름을 따라 가듯이, 가다 보면 출발지점에서 종착지점에 이르듯이 젊음도 사랑도 그떻게 훌러 인생이 가는 것이다. 요컨대 '낡(늙)-'계의 분화형태를 이루는 어간의 모형은 '낡(늙)-/날(널)-/낙(늑)-' 과 같은 꼴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 보기를 들어 보면 '낡(늙)-'계에 드는 것으로서 '낡다, 낡아빠지다, 낡은이(노인을 얕잡아 보고 하는 말), 늙다, 늙다리, 늙마, 늙수그레하다. 늙은이, 늙직하다, 늙히다'와 같은 꼴이 있다. '날(널)-'계에 드는 것으로는 '나루, 나루질(나룻배를 부리는 일), 나루터, 나릇배. 나르다, 나른하다, 너르다, 너럭바위 (넓은 반석), 너름새 (떠벌이는 솜씨), 널다, 널대문(널빤지로 만든 대문), 널감(널의 재료가 될 목재, 죽을 날이 가까워진 늙은이를 농조로 이르는 말). 널구다(넓히다의 함경도 방언), 널따랗다, 널려지다, 널리, 널어 놓다, 널찍이, 넓다[널웁다(널과 같다)의 준말 ; (여사서),], 넙치 (넓은 고기, 넙치과)'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 '낙(늑)-' 계에 드는 말로는 '낙낙하다(조금 남음이 있다), 느긋하다(부족함이 었다), 느꾸다(늦추다 ;결국 본래의 약속보다 시간을 늘리어서 보다 넉넉한 시간이 되게 했음을 드러낸다), 늑장(곧 볼일이 있음에도 블구하고 딴 일을 하고 있는 느린 짓), 늑줄주다(엄한 감독을 늦추어 줌), 늑하다(느긋하다)'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 다음으로 중세어에서 '널 (늘)-' 을 중심으로 하는 말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한다.
'널-/늘-' 의 낱말겨레
1) '널'_계-널(초두해) 15-2), 널다((해요) p. 68), 널뒤기 (물보), 널문((초박해), 상-58), 널오다(넓히다 ; (역해보), 29), 널쭉(역해), 상 66) /너ㄹ다(번소), 10-29), 너러바회 (송강), 1-4),너럭이소라(물보), 주식), 너룹다(여사서), 4-2) 등.2) '늘_'계_느러가다(느릿느릿 가다 ; (유합), 하 51), 느러나다(유합), 하 62), 느러지다(한청 2O5 a), 느리다((한청), 280 C), 느리혀다(능엄), 2-48), 늘횟늘횟(역해보), 60) 등.
모음이 바뀜에 따라 말의 겨레가 불어남은 현대어와 다름이 없고, ' ? ' 등의 음운이 소실되거나 '널오다, 너룹다, 널문' 처럼 사용빈도가 줄어 죽은 말이 된 것도 보인다.
6-5. 뚫림과 막힘
나무에 뚫어진 구멍을 메운다고 자꾸만 깎으면 끝내 그 구멍은 커질 도리밖에는 없다. 그때서 '구멍은 깎을수록 커진다'고 했을까. 허물을 감싸고 얼버무리려고 하면 할수록 그 허물은 더욱 크게 드러남을 비유하고 있다. 물건이나 땅이 뚫어지거나 파인 자리를 구멍이라고 하거니와 이때 구멍을 내거나 막힌 것을 갈라서 통하게 하는 동작을 '뚫다'라고 한다. 한 부분 곧 한 쪽을 증심으로 하억 물체에 구멍을 냄으로써 다른 부분파 이어진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롱해 두 개의 양면이 이어져 서로 통하게 되고. 한 물체가 부분적 으로나마 두 면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뚫려야 할 곳이 막히고 막혀야 할 사물이나 장소가 뚫릴 때, 말 그대로 구멍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삶의 순환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바, 순환과정의 한 과정이 막히면 다른 곳도 잇따라 막히게 되 어, 모두는 제 본래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막혀야 할 데가 뚫릴 경우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상수도를 생각해 보라 어느 한 곳이 잘못되면 다른 장소에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 혼히 누수현상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일을 뚫림현상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엣말에서 '뚫다'는 '뚤다(박해) 중 35), 듦다(두요), 상 8), ㄸ다(역해보), 45), 뜻다(박해), 하 52), ㄷ다(남명), 하 27)' 와 같은 여러 가지 변이형으로 실현된다. '뚫다'의 형태를 풀어 보면 '뚫-十-다>뚫다'인데, 이때 '뚫'은 '둘[二]'의 변이형으로 보인다. 첫소리에서 된소리되기 (>ㄸ)가 일어난 것 이고. 히웅(ㅎ) 종성체언이라는 점에서는 '뚫'이나 '둘(ㅎ)' 이나 마찬가지이다. 구멍을 뚫는 것은 상반된 두 개의 면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둘의 상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뚫린 구멍을 통해서 두 면을 다 보게 되니 떱 은 이치에 통하다'라는 뜻으로도 '뚫다'를 쓰게 되었을 것이다. '뚤(ㅎ)-' 과 상관을 보이는 말로는 '뚤뚤(물건을 여러 겹으로 감거나 맛는 모양), ㄸ다(뚫다의 경상도 방언), 뚫리다, 뚫어 내다, 뚫어뜨리다, 뚫어새기다'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
6-6. 똥과 뒤
뒤를 볼 부인이 국거리를 썰 일이 바쁠 경우를 일러 '똥 마려운 계집 국거리 썰 듯'이란 속담을 쏜다. 급한 일이 있을 경우 그만큼 관심이 쏠리지 않는 일은 아무렇게나 해치움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 또는 동물이 음식물을 먹고 삭이어 항문으로 내보낸 찌끼 또는 갈아 쓰는 먹물이 벼루에 말라서 붙은 찌끼를 '똥'이라고 한다. 똥은 배설작용의 결과이고 배설작용은 신진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가는 데는 입이요, 다시 나오는 곳은 항문이다. 좀 예스럽긴 하지만 변소에 가는 것을 '뒤 보러 간다'고 한다. 창피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뒷간 개구리한씨 하문(下門) 물렸다'고 하며, 변소가 가까우면 냄새가 나고 사돈집이 가까우면 말이 많다고 해서 '사돈과 뒷간은 멀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뒷간'은 변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도 경기. 강원. 층청.전라.경상 지 역에서는 혼히 쓰는 말이다. 변소를 뒷간이라 함은 냄새가 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항문이 몸 뒤에 있기 때문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필자는 '똥'이 바로 이 '뒤'에서 비롯한 말이 아닌가 한다. 음식이 들어가는 입이 앞이라면 음식이 소화되어 나오는 항문은 뒤인 것이다.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고 한다, 겉으로는 얌전한 체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짓을 다 함을 비유하는데, 이때의 뒷구멍은 똥을 누는 구멍 곧 항문을 듯한다.
중세어에서 '뒤'는 히읗(ㅎ)종성체언으로서 '따(ㅎ)>땅>땅, 집우(ㅎ)>집웅>지붕'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뒤 (ㅎ)>뒹>둥>동(똥)>똥'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살피건대 표기되는 형태로 보아 '뒤'는 두 갈래로 발달해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뒤 (ㅎ)>뒹>둥>동(똥)>똥'과 '뒤 (ㅎ) >뒷 [뒷다((월석)21-1l8), 뒷치다(삼역), 6-3)]' 이 그것이다. 음식이 들어가는 '입'은 옛말에 '문. 창문'과 같이 앞올 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기능면에서 보아 입과 대립되는 '항문', 그리고 항문과 깊은 연관을 보이는 '똥' 이 뒤를 뜻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과 뒤는 방위 개념으로서 '님了곰'에 해당하는 말이다. '앞(남)/뒤 (북)'으로 쓰인 적도 있다[뒷심골]; (용가) 2-32), 뒤北((훈몽), 증 4)].
배설물로서의 '뒤'와 관계되는 말의 겨레를 살펴보면 '뒤보다(똥 누는 일을 점잖게 일컫는 말), 뒤틀(매화틀 ; 방안의 변기통을 미화한 말), 뒷간, 뒷거름(인분), 뒷구멍, 뒷물(항문올 씻는 일), 뒷물대 야, 둥개다(쩔쩔매다 ; 똥을 으깨어 플려니까), 뒹구르다(똥에서 구르다)' 등과 같은 형태들이 있다. 먹는 것 못지않게 배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흘러 가야 할 물이 흐르지 않고 괴어 있듯이 소화돼야 할 음식이 밥통에 그냥 있는 상태를 '체하다' 라고 한다. 앞과 뒤는 따로 중요한 몫을 차지 하는 것으로서 입이 받아들이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항문이 내보내는 기능을 잘 하여야만 사람은 알찬 건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6-7. 가루와 분절
체로 치는 가루는 칠수록 곱게 되나, 말은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거칠게 되기가 쉽다. 그래서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고 했던가. 가루는 특정한 사물이 분화하여 쪼개진 결과 생겨나는 것이다. 생믈의 생성과정을 보면, 생물계의 진화가 그러하듯 단일에서 복합으로 갈라져 나아간다. 중세어에서 가루는 'ㄱ ㄹ((원각), 상 2-2 의 154)' 였다. 이 형태에 터를 둔 낱말들이 여럿 확인된다. 'ㄱㄹ (용가), 2o))' 의 예를 들어 보자. 물이 흐르면 그것을 경계로 하여 반드시 지역파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선의든 악의든 간에 마을과 마을, 고을과 고 을,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가 갈리어 금을 긋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마을이 이루어지는 요건 가운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물이다. 강을 가운데로 하여 서로가 독립 된 취락 흑은 부족을 이루어감은, 강이 갈라짐 곧 가루의 속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세 갈래 길에서 지역이 갈리듯이 모든 생물들은 갈라짐(분화)의 질서를 따라서 그 종족의 번영과 보존을 꾀한다. 쪼개어 갈라지는 곳에 생식의 기능이 부여됨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가루'는 오늘날 방언에서 '가루. 갈기. 갈구'와 같은 변이형태들로 나타난다 '가루(한반도 전역), 가리 (전북 부안. 고창. 정읍.순창/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덕. 영일. 포항. 영천. 군위. 칠곡 대구), 갈기 (경남 고성/강왼 속초 양양), 갈구(강원 강릉명주) 등이다. 가루는 '가락'으로도 그 모습을 갈래지어간다. 물레로 자은 실을 감는 쇠꼬챙이를 가락이라고 하거니와 이것은 실을 갈라 가지런히 감음으로써 셈의 단위가 된다. 실 한 가락이 이어져 뽑아 나옴을 연상하여 노래의 어울림을 '가락'이라고 한다 가락국수나 가락엿 또한 예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가루'는 어말모음이 떨어져 '갈-' 계의 꼴로 나타나기도 한다. '갈다'는 굵은 곡식알을 잘게 쪼개어 놓는 동작을 말하며 기차 또는 자동차를 옮겨 타는 일을 '갈다. 갈아타다' 라고 한다. 생각건대 차를 갈아탐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림, 즉 바로 앞서 풀이한 분화의 분기점울 전제로 한 것이 아닐까 ' 갈기갈기 (여러 가닥으로 찢어진 모양), 갈태'와 같은 형태도 가루의 특성을 바탕으로 분화된 꼴로 판단된다. 흔히 종류를 '갈래'로 말하는데, 갈라진 한 무리 혹은 그러한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의 족속(族屬)을 '겨레'라고 하는바, 이는 갈라진 사람들의 무리 혹은 흐름을 이르는 말이다. 때로는 켤레'와 같이 짝을 드러내가도 한다. 원몸에서 갈라져 나간 지체란 뜻이 이 말들 속에 담겼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의 '겨드랑이'도 이러한 테두리에 들어가는 말의 한 가족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