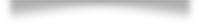우리말의 상상력 1 - 정호완
5. 물의 순환
5-1. 솟음과 거룩함
민속놀이에서 '솟대장이'란 탈을 쓰고 솟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짓으로 온갖 재주를 부리는 재주꾼이다. 여기에서 '솟대' 는 농사를 크게 짓는 대농가에서 세 안에 다음 해의 풍년을 바라는 뜻으로 볍씨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늦이 달아 매는 장대를 뜻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늦이 솟은 장대' 를 가리킨다. 그것은 하늘을 향하여 더 높이 올림으로써 경건하고 간절한 씨 천의식을 드러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솟대는 또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보다 잘 되게 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마을 입구에 높이 세우던 붉은 장대로, 우러러 보는 대상물이기도 하였다. 솟대의 끝부분에는 푸른 칠을 한 나무로 용을 만들어 달아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솟대'는 우리의 역사기록에도 나오는 바, 소도(蘇塗)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도는 마한. 변한. 진한 시대에 하늘의 신에게 제사지내던 지 역이었는데, 각 고을에서는 제사지내는 신단(神壇)을 베풀어 그 앞에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우고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제단은 언제나 단을 쌓아 올리든지 아니면 나무를 세워 마련된다. 거룩한 공간은 정신적으로도 높은 곳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숭배하기에 알맞은 곳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솟대'가 바로 이러한 말에서 기원하엿을 것임을 유추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소도(蘇塗)'가 '숟'을 표기하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흔'은 시간과 공간을 따라 바뀌어 가면서 '숟[蘇塗]>솟'으로 되었으며, 받침 글자의 넘나듦으로 '훈(솥)/솟/솔'의 꼴들이 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형태들온 다시 자음과 모음이 바뀌면서 '솟아 있는 모양'을 드러내는 말들로 발달해 간 것이다. 신을 제사하기 위하여 만든 제단에서 비롯한 일종의 솟음의식의 결과라고나 할까. '훈'계는 그리 많은 보기는 찾아지지 않는다. '숟 덩(料). ㅅ 확(鎖) ((훈몽) 증 IO)' 과, '距賊數十里壹料山훈뫼峯料山在雲峯縣東十六里(용가)' 의 땅이름 'ㅅ뫼' 정도에서 '솜(>솥)'이 확인된다.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 제물을 만드는 '숟(>솥)' 은 신성한 것이었다. 밥솥조차도 불을 땔 아궁이의 제일 두드러진 곳에 걸지 않는가. '솥' 과 같이 생긴 그릇에 제사 음식을 담기도 하였다 한다. 이렇듯 오늘날의 '솥'은 '숟'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디굳(ㄷ) 받침이 거센소리로 된 결과 티올(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솔'계는 '숟'의 받침이 유음(ㄹ)으로 되면서 갈라져 나간 말인 바, 소나무를 가리키는 '솔'이 그 대표적인 어형으로 보인다. 지금은 무당이 솟대로 대나무를 쓰지만 옛적에는 소나무를 샜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솔' 도 제단에 쓰는 신성한 솟대로서 '숟'으로 기록하다가 뒤에 '솔'로 바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솔'파 관계 았는 말은 그 보기가 상당히 딱다. 이를테면 '솔1 (소나무)', 솔(먼지를 떨거나 물감 따위를 칠할 패 쓰는 도구 ;뾰족해 솔잎에서 유추하여 쏜 것으로 보임), 솔가리(말라서 땅에 떨어진 솔잎), 솔가지 (꺾어서 말린 소나무 가지의 뻘나무), 솔과(科), 솔나물, 솔나방, 솔딱새, 솔방울, 솔포기(비늘 같은 소나무 껍질),솔뿌리, 솔새 (벼과의 다년초), 솔부엉이, 솔밭, 솔이끼, 솔잎, 솔장이 (플칠하는 솔을 만드는 사람), 솔포기 (가지가 다보록한 작은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겨우살이'와 같은 말들이 있다.
'숟'이나 '솔'과는 달리 '솟'으로 발달해 간 '솟'계가 있는데 소릿값의 실현으로 보면 '숟'이나 '솟'이나 다를 게 없다. 모두가 무성 내파음 디굳(t)으로 소리가 나기 때 문이다. 이 형태가 접미사'_다'와 합하여 동사를 만들어 간다. 그 보기를 들면, '솟다, 솟고라지다(솟구쳐오르다), 솟구치다, 솟대, 솟대장이, 솟아나다, 솟아 오르다, 솟을 꽃살창(창살을 꽃무늬로 만든 창), 솟을대문(행랑채 보다 높이 솟은 대문), 솟올동자(머름의 간막이를 한 작은 기등), 솟을무늬(피륙의) 도드라지게 놓인 무늬, 솟치다(위로 높이 올리다)'와 같은 형태들이 보인다. 나물이나 풀싹이나, 나무가 배게나 있는 것을 사이가 뜨도록 하기 위하여 뽑아 내는 동작을 '휴다' 라고 히는데 이 '휴다' 도 '솟' 계에 드는 말로 추정된다. 중세어를 보면 '솟고다(>솟다>휴다 ; (한청)' 에서 발달해 온 것으로 검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대어 자료로서 오늘날의 '솥'이 '솟(동문, 하 14)' 으로도 기록된 것을 보면 확실한 음운의식은 아닐지라도 '숟/솟/솥'이 같은 말 '숟'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솟'에서 모음교체나 자음교체로 말미암은 형태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우선 오(ㅗ) 와 우(ㅜ) 의 교체를 들 수 있다. 명사 위에 붙어서 본디의 성질을 드러내는 '숫'계의 말들이 '솟'에서 분화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의 제단에 바치는 제물은 신성해야 하며 아무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특성이 있기에, 사물 인식에서 그러하다고 본다. 불이 탄 뒤에 나무의 등걸을 재나 아궁이에서 처리하여 만든 '숯' 도 증세어에서 '숫爲炭(((훈례),)' 이라 한 것을 보면 상관성이 있올 듯싶다. 여기에 속하는 말들로는 '숫겅 (숯의 경상도 방언), 숫가락(-솟대처럼 솟아 있는 모양에서 유추한 듯하다), 숫국(아주 진솔한 사람이나 물건), 숫되다(어수룩하다), 숫돌(칼을 갈기에 알맞게 솟아 있는 돌), 숫색시, 숫접다(순박한 태도가 있다), 숫지다(인정이 후하다), 숫처녀, 숫하다(순박하고 어수룩하다)'와 같은 말의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솟' 의 모음 오(ㅗ) 가 어(ㅓ)로 바뀌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보통 저 있다>섰다'로 풀이하지만. 원래의 기본형이 '섯 (_섣)'으로 보인다. 앉았다가 일어서면 높이 솟아 있는 상태를 이루게 된다. 물가에 배를 매어 두기 좋은 곳이나, 서슬이 불끈 일어나는 감정 또는 물건의 두께를 '삯'이라고 한다. 칼날이나 물건의 날카로운 곳을 '서슬' 이라고 하는바, 이러한 보기에서 '섯' 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모옴교체와 더블어 자음교체를 따라 '솟'계의 말들은 같은 속성의 다른 말들을 분화시켜 나아간다. 자음교체를 따라 '솟'은 '줏/젓/잣'으로 그 음성을 달리하면서 말의 뜻이 달라진다. 그렇지만 그 솟이 있는 모양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들은 모두 생식이나 생명, 흑은 성장과 관계가 있는 말들로 가지 변어 나아간다. 성숙한 남자의 생식기를 '좇'이라고 표기하지만 지금도 많은 방언에서는 '줏'이며, '젖' 또한 넷' 인 것이다. 남근 숭배의 사상과도 멀지 않음이니, 그 생명의 비롯됨을 신성시하는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젖'도 그 모양을 보면 후대를 양육하기에 알맞도록 솟아 있다. 이처럼 언어는 자연을 인식하는 방법이나 그 소리의 느낌을 따라 말의 꼴들이 분화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5 -2. 속과 솜
속이 텅 비어 있는 강정이 먹을 것이 없듯이 속으로는 아무런 실력도 없으면서 겉치레만 일삼을 패, '속빈 강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깆숙히 안에 들어 있어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사물을 가리켜서 '속'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추하여 마음의 한가운데, 배의 속 자리를 뜻하는 수도 있다. 속은 겉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참' 과 동일한 뜻으로 쓰인다. 겉만 있고 그 내용(속)이 차 있지 않은 상태가 거짓이요, 그 반대가 참이지 않은가. '속'이란 명사에 접미사 '-다'가 붙어 '속다'가 만들어진다. 남의 꾀에 넘어 가거나 거짓을 참인 줄로 아는 것이 '속다'라면, 거짓을 참으로 곧이듣게 하거나 거짓말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롭도록 꼬이는 것은 '속이다'라고 할 수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자기자신이 속은 것 모두 내용(속)에 관한 관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우선 명사 '속'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는 보기들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속가량(속으로 대강 쳐 보는 셈-겉가량), 속가루(쌀이나 고추 같은 것을 빻을 때 나중에 되는 가루). 속가죽(겉가죽 안쪽에 있는 가죽), 속가지(삽요어 ; 擇腰語), 속감(쌍시의 속에 든 감), 속갱이 ('관솔'의 경삼도 방언), 속겨 (고운 겨-겉겨), 속고갱이, 속고름, 속고샅(지봉을 이엉으로 이을 래 먼저 지붕 위에 건너 질러서 매는 새끼), 속고의 (속바지), 속곳바람, 속커 (안쪽의 귀), 속긋(글씨나 그림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덮어 씌우게 하기 위하여 먼저 가늘게 그리어 주는 획), 속긋넣다(속긋을 그어 주다), 속꺼풀, 속껍데기, 속끓이다, 속나깨 (메밀의 고운 나깨), 속내평 (속 내용), 속눈 뜨다(겉으로는 눈을 감은 체하면서 속으로는 무엇을 조금씩 보다), 속눈셉, 속다, 속다짐(속셈), 속닥이다(쏙닥이다 ; 동아리끼리 가만히 이야기하다), 속달거리다, 속달다(안타까와지다), 속대, 속대쌈(배추의 속대로 싸는 쌈), 속더께 (찌든 물건에 낀 속의 째), 속등겨, 속뜨물(곡식을 여러 번 씻은 뒤에 나오는 깨끗한 뜨물), 속마음, 속말, 속바람(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몸이 떨리는 현상). 속버선, 속벌(속에 입는 옷의 각 벌), 속보이다(속에 품은 마음이 드러나다), 속뽑다(속을 알아 내다), 속삭이다, 속살(옷에 가리어진 부분의 피부), 속살다(속으로는 버티고 겨루는 뜻이 있다), 속살이(게의 일종), 속살찌다, 속서근풀 (황금초 ; 黃후草), 속속들이, 속아리(속병), 속없다(줏대가 없다), 속이다, 속적삼, 속주다(숨김 없이 말해 주다), 속창(구두에 덧까는 창), 속치마, 속치레, 속치장, 속탈(소화가 안 되는 병), 속힘 (실 력) 등.
시대를 거슬러 중세어의 자료를 보게 되면 '속' 의 형태는 '솝 리(舊)(훈몽), 하 34), 솝 정(精) (훈몽), 상 33), 솝서근풀((사성),하)' 등에서 '솝' 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뜻을 드러내는 변이헝으로서 '씁(몸쏘블보리옥 ; (능엄) 1-64)' 의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 그럼 '솝/속'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보기는 아니지만 말의 받침으로 쓰이는 비읍(ㅂ)이 변천과정에서 이른바 자음교체를 따라 기역(?)으로 바뀐 결과로 보면 좋을 듯하다. 예컨대 거봅/거북(능엄)), 붐>북((석보), 6-82), 부섭>부엌' 등에서 그러한 보기를 찾을 수 있으니, '솝>속'도 예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도 지명에서는 '속'에 해당하는 말이 '솜[이리 (理里)-솝리>솜니] 으로 쓰이고 있으니, 그것은 중세어 자료에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가 아직 어휘의 고도(孤島)처럼 살아 있는 경우라 하겠다.' 하나의 음절과 또 하나의 음절이 만나 그 소리가 달리 쓰이다가 아예 달리 소리 나는 대로 굳어져 하나의 형태로 쓰이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를 이른바 형태음소적인 변동에 따른 말의 변천이라고 풀이한다. 옷을 해 입을 때에 쓰이는 '솜'도 따지고 보면 열매 부분의 속이라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화도 삭과 즉 터지는 열매의 하나로서 그 속이 여러개의 칸으로 나뉘고 각 칸에 많은 씨가 들어 있다. 한마디로 '솝'과 '솜'이 넘나들며 쓰이다가, 아예 '솝'으로는 그 형태가 인식되지 압고 '솜' 으로만 굳어져 버린 결과이다. '솝' 이 쓰이지 않은 그 빈 자리에 받침이 바뀌면서 '속'이 쓰이게 되니 같은 뿌리에서 나와 '속/솜'으로 갈리어 그 가지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솜은 목화씨에 달라 붙이 있는 섬유질의 한 부분이다. 파란 다래는 가을을 살다 검은색 다래로 변하여 마른다 다시 다래는 세로로 갈라져 그 사이로 하얀 솜의 속살을 드러내 어, 말라가는 목화에 또 다른 계절의 꽃인 양 피어오른다. 솜은 희고 부드러우며 가벼운 것으로서 목화의 씨를 감싸는 옷이기도 하며 겉껍질과 씨의 사이에 끼어 있어 겨울을 지내기에 알맞도록 그 씨앗에 견 딜성을 더해 주지 압는가. 이러한 보온과 탄력, 가벼움의 장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솜을 틀어 실로 옷감을 짜기도 하며, 고 자체를 옷의 겉과 속 사이에 끼워서 쓰기도 한다. 그 쓰임에 있어서나 그 본질에 있어 솜은 속올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겠다. 결국 솜은 목화씨를 감싸는 옷일 뿐더러 사람을 감싸 주는 옷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솜'과 상관을 보이는 말의 형태로는 '솜, 솜돗(솜을 얇게 펴서 솜반을 만드는 돗자리), 솜몽둥이, 솜방망이 (엉거시과의 다년생 풀), 솜버선, 솜병아리(알에서 갓 깬 병아리), 솜붙이(겹옷 빔을 철에 임는 솜옷), 솜사탐, 솜옷, 솜털, 솜채 (솜올 잠재우기 위해 두드리는 대나무), 솜화약(솜을 황산과 질소의 혼합액에 적셔 만든 화약)' 등이 있다. 냉수 마시고 속을 차린다고 하거니와 참으로 속이 찬 사람, 속이 차 있는 세상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막 곧 솜이 알맞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겠다. 솜은 솜으로서의 고유한 구실이 있듯이 겉껍질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이 있다. 겉과 속이 걸맞은 그러한 누리야말로 살아 볼 만한 세상일 것이다.
5-3. 불의 겨레
개가죽이 불에 타면 우선 오그라들기 마련이다 하는 일이 늘어 가지는 못하고 자꾸만 오므라들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불에 탄 개가죽 같다'고 한다. 사람이 오늘날과 같이 문명생할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의 하나로 불의 구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힘이 세고 큰 동물이라도 블에 타지 않는 것은 없다. 호랑이도 불을 보면 도망을 간다고 한다. 불은 그 속성으로 보아 빛과 열을 수반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한 것에는 불을 붙여 말하는 일이 종종 있다. 불이 빨갛고 환하게 보이기 때 문에, 꽃이 벌어지는 것을 핀다고 하며, 아픈 얼굴이 건강하고 고와지는 것을 핀다고 하지 않는가. 옛말로는 '블(석보), 9-37)' 이었는데 뒤로 오면서 '불'이 되었다. '블'은 받침으로 기역(ㄱ)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블'이 '붉다/ㅂ다'로 쓰이는 보기들이 확인된다 '블근섬, 블근못 등은 '붉다'가 다른 말과 합성하여 드러난 지명이고, 기다, 블곰 등은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오늘에 와서 '불'을 중심으로 한 말들은 하나의 겨레를 이룰 만큼 다양하게 발달되어 쓰인다. '불그덩덩하다, 불그데데하다(좀 야비하게 불그스름하다), 불그레하다, 불구무레하다(태가 나지 않고 엷게 불그스름하다}, 불그스름하다(조금 붉다), 불그죽죽하다(칙칙하게 불그스름하다), 불끈거리다[(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걸핏하면 성을 잘 내다=, 붉디붉다, 붉히다' 등 상태 또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낱말의 밭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이들 '붉-' 계의 형태들은 자음이 갖는 소리의 느낌을 따라 더욱 강한 말로 바뀌어 쓰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같은 형태인데도 된소리의 자음이 옴으로써 보다 강한 느킴을 받게 된다. '뿔그스럼하다, 뿔구무레하다, 뿔그죽죽하다, 뿔끈거리다'와 같이 형태의 변이를 가져 오는 일이 때때로 있다. 이어서 '밝-' 계의 낱말로서 그 무리를 보게 되면 '발갛다(>빨갛아), 발가벗다(<빨가벗다), 발깍(<발칵/벌컥), 발간(<빨간 ; 아주 터무니 없는), 발강이 (<빨강이), 발개지다(<뻘개지다), 발그레하다(약간 곱게 발그스름하다), 발그스름하다(<빨고스럼하다)'등의 형태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중세어에서 '블(붉)/ 블(ㅂ)' 올 중심으로 하는 낱말의 겨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블/블계의 낱말겨레 (중세어)
1) '블- 계-블(석 보) 6-33), 블강도(火賊 ; 동국삼강; 열 4-61), 블거ㅎ다(구급간 6-8). 블찌디다(유합)하 62), 블곧(동국삼강), 효 4-88). 블그트렁이 (유합 하 52), 블근못((용가), 7-25), 블근섭((용가) 1-8), 블내다((한청 317), 블똥((한청) 317), 블디 ㄹ다(유합), 하 4I), 블딛다(블을 때다, ((훈몽) 하 12), 블리다((한청) 311 d), 블묻다(노해) 상 23), 블붙다((능엄) 8-75), 블빛(유항) 하 54), 블사개 (한청), 398 d), 블퇴 (((한청), 317), 붉다{(두해1 초 7-26), 붉히다((한청) 230), 붉나올(불꽃; (금삼, 3-29) 등.
2) '블-'계-블가하다((월석) 2-58), 블기다((용가) 30), 붉가숭(발가숭이 ; (청구), 대학본 p. 136), 밝다(용가) 71) 등.
이상의 '블 (블)-'에 대한 보기 1) 2)에서와 같이 현대어에 비교하면 경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어휘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어에서 현대어에 이르도록 '불'이 기역(ㄱ) 특수곡용을 하는 형태적인 특성을 보임에는 변함이 었으나, 점차 리을(ㄹ) 발음은 약화되고 기역(ㄱ) 받침으로만 발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음 셋이 연속될 때는 중간자음이 묵음이 된다. 폐구조음원칙에 따르면 입술이나 연구개(혀뿌리)에서 나는 소리가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ㄱ' 계가 더 이상적이지만 언어현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어서 '밝다'의 방언분포에서 보는 것처럼 '-ㄹ' 계도 많은 방언분포를 갖고 있다.
'밝다'의 방언 분포
1) [발따]-경북 영천. 포항. 영덕. 대구. 김천. 의성. 예천. 안동. 영주. 청송. 울진. 평해스경남 울주. 양산 울산 동래. 김해. 부산. 마산 창녕 등
2) [볼다]-경남 마산 등.
3) [박다]-경북 고령 영양.성주/경남 합천. 함양. 산청 진주 충무. 저창. 밀양 진양 고성. 의령 등.
4) [복따]-경남 거제. 남해. 함양 등.
5) [뽁다]-경남 남해 등
6) [북따]-경북 영천了경남 하동. 합천. 산청.사천 등
5-4. 물의 순환
가뭄이 들고 논에 물은 넉넉지 않은데, 자기 논에만 물을 댈 때. 결국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를 비유하여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한다. 물은 지구 표면적의 약 7 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체의 몸 속에는 7할에서 9할에 이르는 수분이 있다. 진실로 물은 생명의 고향이요 원천임을 알겠다. 공기가 지구의 옷이라고 한다면 물은 지구의 피라고 하여 지나침이 없다. 끝없는 사막도 물만 있으면 옥토가 될 수 있으며, 온갖 생물이 새끼를 치게 된다. 물이 전혀 었다면 부패는 물론이요, 생물체 내의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의 신진대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 물은 흐른다. 둥근 지구를 따라 흐르니 마침내 큰 원형의 바퀴를 이루고 돌아가뜬 셈이다. 옛말에 물은 '믈'이었고, '물'은 하나의 무리 곧 떼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옛말에서 '믈'에 대립되는 형태로서 '블'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분명 '맑' 계의 꼴로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ㅁ'계의 꼴과 서로 대립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어에 '물'이 쓰이는 모양은 '물(ㄱ)' 계와 '말(ㄱ)' 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계열은 구체적으로 어떤 꼴로 나타나는가 살펴 보도록 한다.
'물(ㄱ)'계에는 '물거품, 물결, 물긋물긋하다(묽은 듯하다), 물쿠다, 물덤벙 술덤벙(대중없이 날뛰는 모양), 물렁하다, 무르다, 무르녹다, 물잡다(마른 논에 물을 대어 두다), 물집, 물큰거리다 (물컹한 감각), 물큰물큰, 물타작(미처 마르기 전에 물벼를 그대로 하는 타작), 물컹이 (물컹한 물건), 물할머니 (샘의 귀신), 물호랑이(범고래), 묽수그레하다(조금 묽은 듯하다)'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 한편 '맑-'계에는 '말갛다, 말개지다, 말그스름하다, 말긋말긋(액체 속에 덩어리가 섞인 모양), 말끔하다(티없이 깨끗하다), 말랑거리다, 말랑하다, 말캉거리다(평안도에서는) 말큰거리다 ; 너무 익거나 옳아서 좀 무르다, 말캉하다, 몰칵(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갑자기 나는 모양), 몰캉거리다, 몰캉하다, 꼴큰(연기나 냄새가 갑자기 나는 모양)'과 같은 형태들이 있다. '물'은 옛말을 보면 지명에서 '매 /미'로도 드러난다. '매끄럽다, 매 끈거리다, 매끈하다, 매끈둥하다(퍽 매끄러운 맛이 있다), 미끄름, 미끈유월[(빠르게 지나가는 유월이란 뜻으로) '음력 유월'을 달리 이르는 말], 미꾸라지, 미끄러뜨리 다' 등이 '매 /미'와 물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말들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나는 '水-買' 의 대응이 말해주고 있듯이 '믈' 계는 '미 '계로도 발달하였다. 어두자음의 소리상징을 따라서 분화된 형태로 보이는 것은 바로 '미/비/피'의 대림적인 낱말의 겨레들이라고 하겠다. 이들 형태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미 '이다. 소리 상징으로 보면 가장 평범한, 정지상태 이거나 운동상태이더라도 파열성 없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음성상징을 드러낸다. 물이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린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순환하여 하나의 고리를 이루는 것이다. 비는 농경사회에서 생명과도 같은 구실을 하였다. 제때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온 부락이 회동하여 부정탄 사실들을 처단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피'는 직접 동물의 몸 속을 돌아 흐르는 가장 생명적인 미 '의 변형이 된다. 미 /비/피'와 관런한 낱말의 떼 중에서 미 '는 현대어로 올수록 분포가 얼마 안 되고 '비/피'를 증심으로 하는 낱말겨레는 상당히 넓은 분포를 보인다. 중세어 자료에서 보이는 '믈-'계의 낱말겨레는 다음과 같다.
'믈-/맑-' 계의 낱말겨레
I) 믈-'계-믈(석보), 13-33), 믈ㅅㄱ래 (한청,, 29 c), 믈가지(역해), 하 11), 믈견흠(물 깊이 겨냥 ; (유합, 하 IZ). 믈결 ((유합), 상 6), 믈고기 (소해; 3-25), 믈구뵈 (혼몽), 하 35), 믈그여디다(믈크러지다 ; (유합), 하 59), 믈끄이다(큰물지다 ; (훈몽), 상3), 믈담다(물에 빠지다), 믈떰(물방울 ; (유합), 하 6o), 믈되야지(돌고래), 믈쯔다(젖다 ; (동문) 상 8), 믈방울(송강), 2-14),믈미다(물밀다), 믈불회 (물의 근원 ; (유함) 하 8), 믈쇼(역해보) 48), 믈언덕 (훈몽) 상 3), 믈에군사(水軍 ; (삼역) 3-6), 믈여위다(물이 마르다 ; (유합)하 5o), 믈줄(유합)하 41) 등
2) ㅁ-'계-묽다((구급방) 상 27), 맑다(초두해) 8-24), 맑안츠다(맑게 가라앉히다 ; (구급방) 상 10) 등.
위의 보기에서와 같이 'ㅁ +모음十ㄹ/ㅁ+모음'의 어근형태에서 파생하여 상당한 말의 겨레를 이루었다. 음운론적으로 원순모음화를 겪어 '믈>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태론적으로는 특수곡용을 하는 '물(ㄱ)' 계의 말들이 보이는데 오늘날의 방언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물(ㄱ)' 은 모음이 바꿩을 따라 '맑(ㅁ)-' 계의 어휘들을 분화시켜 나아갔다. 물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물이 있음으로써 풀. 나무 등의 식물이 있고, 다시 동물의 삶이 가능한 것은 자연의 이치일진대 물을 비롯한 자연에 대한 조심스러움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