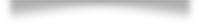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어느 여인의 이름 - 최초로 이 땅에 시집 온 여인
옛사람의 이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여성이름이 있다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황옥이 그 주인공이다. 대게 성도 없이 이름만 고유어로 불린 다른 여성들에 비해 현대 여성 못잖게 제대로 갖춘 한자식 이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허황옥은 놀랍게도 그 옛날 머나먼 인도 땅에서 이 땅에 최초로 시집 온 이국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콧날이 오똑하고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현대의 "미스김"이나 "미스허"는 특히 이 이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여인이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할머니가 되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부터 무려 1947년 전의 일이지만 "삼국유사"는 이 여인의 생애를 매우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허황옥은 서기 32년에 태어나 열 여섯 나이에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에게 시집 오기 위해 머나먼 항해길에 오른다. 허 소녀 일행이 맨 처음 발을 디딘 곳은 김해 앞바다 망산도, 진해시 용원동에 있으나 지금은 간척 공사로 이미 섬은 아니다. 신부를 맞기 위해 나온 여섯 살짜리 신랑은 망산도와 왕궁의 중간 지점인 명월산 산자락에 장막을 치고 신부를 맞는다. 수로왕과의 첫 대면에서 신부는 먼저 입고 왔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께 바치고 신랑앞으로 나가 자신을 소개한다. "신첩은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씨요,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열 여섯입니다.외람스럽게도 매미같은 얼굴로 용안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바지를 벗어 던지는 것은 인도 남부 지방의 전통 혼례 관습이란다. 이에 여섯 살짜리 신랑은 으젓한 태도로 화답한다. "이제 현숙한 그대가 스스로 왔으니 이 몸은 행복하오." 당시 이들 신혼 부부가 주고 받은 대화가 중국어였는지 아요디아(ayodhya)어 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통역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니 이들은 한가지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으리라 짐작된다.
우리나라 국제 결혼 제 1호로 기록될 법한 신혼례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이들이 보낸 첫날밤에는 달이 무척 밝았던 모양이다. 신방이 꾸며졌던 산을 지금도 명월산이라 부르고, 전에는 명월사라는 절도 있었다고 하니 말이다. 이틀 밤과 하루 낮이 지나고서야 이들은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 가야국의 왕실로 환궁한다. 황금알에서 태어난 수로왕과 인도처녀와의 이 세기적 결혼은 허황후가 157세의 나이로 승하할 때까지 지속된다. 그동안 열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고, 이들 가운데 한 아들은 어머니의 성 허씨를 하사받아 오늘날의 김해 허씨가 출현하게 되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두 성인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지금도 혼인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신화나 전설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데 수로왕의 건국 신화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중매를 섰는지도 의아하고, 그 시절 그렇게 먼 뱃길 항해가 가능했을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가야국의 신비라 일컫는 이 의문은 최근 두 마리의 마주 보는 물고기, 즉 쌍어문의 흔적을 추적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씩 풀려 나가고 있다. 수로왕릉이나 신어산 은하사의 대웅전에 그려진 이 물고기 문양은 멀리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비롯되어 인도 남부 아요디아와 중국의 보주 및 무창을 거쳐 우리나라 김해일원과 일본의 구슈등지로 흩어져 있다. 이 흔적이 이 민족의 이동 경로를 알려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이야. 허 왕후는 지금도 수로왕의 탄생지인 구지봉 옆에 잠들어 있다. 능 앞에는 비석이 서있는데, 이 비명 가운데 보주라는 지명이 앞서 제기한 의문을 푸는 열쇠가 된다. 대게 옛 여인들은 출신지명을 이름으로 삼는 것이 통례인데 여기서의 보주는 인도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땅(정확히 말하여 촉나라 땅이었던 사천성 안악의 옛이름)임이 밝혀진 것이다. 허황옥이 본디 인도 아요디아국의 공주이기는 하나 중국으로 이주해왔고 이곳에서 성장하여 가야국의 왕비로 시집오게 된 것이다. 지금도 보주 땅에는 허씨 집성촌이 있어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허황옥이라는 한자식 이름이 붙은 것도, 배를 타고 이 땅까지 왔다는 기록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항해의 출발지가 인도가 아니라 가까운 중국이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