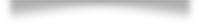「충청도 말에 대하여」(소설가 한창훈)
「충청도 말에 대하여」(소설가 한창훈) 2009년 6월 2일_스물네번째 |
 |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몇몇 사람들 사이에는 5, 6공 시절, 운동권 대학생 잡아들여 취조 고문을 하던 이의 사적인 증언이 떠돌았다. 그자의 말에 의하면 삼남(경상 전라 충청)의 특성이 취조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먼저 경상도 학생. 잡아 족치면 한번에 다 분단다. 그 다음 전라도 학생. 족친 만큼만 분단다. 다음날 조금 더 조져 보면 그만큼만 더 나온단다. 가장 독한 애들은 바로 충청도. 아무리 족쳐도
“물류. 그게 아뉴.”
소리만 한단다. 빨리 안 불어? 아무리 때리고 거꾸로 매달아도, 뭔 소리를 하는지 당췌 물르겄슈, 잘못 아신규, 소리만 해서 결국 내보내고 말았단다. 뒷날 알고 보니 내보낸 학생이 그들이 찾고 있던 사람이란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충청도 출신 어느 시인 왈.
“독해서 그러기버덤은 갸도 말을 하려고 했을 겨. 막 실토하려고 하는데도 말 안한다고 두들겼을 겨. 그러니 원제 말을 햐.”
삼남의 기질 차이는 말투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경상도 말은 왜 그렇게 짧고 공격적일까. 답은 산이 높고 날카로워서. 어떤 방문자라도 불쑥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미 눈앞이라 재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전라도는 리듬을 타야 한다. 산이 낮지는 않지만 구릉이 많고 완만하여 그렇다고 본다. 그럼 충청도는? 평야가 넓은 곳이다. 모르는 이가 저만치에서 나타나면 궁리하기 시작한다. 삼국시대부터 그랬다. 침범이 잦았던 탓에 저것들이 고구려일까, 신라일까, 우리 백제일까, 정보가 모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기에 직설이 없다.
충청도 말이 느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답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직설이 없다 보니 비유가 발달했다.
충청도를 배경으로 비유의 언어를 가장 뛰어나게 구사한 분이 돌아가신 명천 이문구 선생이다. <보기 싫은 새끼>가 충청도 언어로 가면 <장마철에 물걸레 같은 새끼>가 된다.
일전에 친구들과 술집엘 갔다. 안주가 마땅찮아 주저하고 있는데 빨리 안 시킨다고 안주인이 구시렁거렸다. 내가 나서서 한마디 했다.
“뱃속에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곱창도 있고 다 있는데 뭐하러 안주 먹어요. 술만 넣어 주면 되지.”
이문구 선생의 단편 <우리동네 김씨>에 나오는 말이다.
이정록 시인도 충청도 출신이다. 그가 최근에 아들 운동화를 빨다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웃었다. 자기가 아들녀석 나이였을 때 뭔가를 잘못해서 선친께 욕을 먹은 적이 있었다. <저 운동화나 씹어 먹을 자식>이 그건데 무슨 내용인지 오래도록 알지 못하다가 아들 운동화 빠는 순간에 깨달은 것이다(도대체 무슨 말일까. 힌트. 댓돌에 신발 벗어 놓으면 누가 와서 이빨로 씹을까).
요즘 그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해줄, 상처가 되지 않고 되레 웃음이 나는 그런 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
|
-
역대로 사람의 진정한 역사는 - 세종대왕
-
친구야 너는 아니
-
스포트라이트
-
이별과 만남
-
무엇이 소중한가 - 도종환 (75)
-
고비마다 나를 살린 책
-
어울림
-
곁에 있어주자
-
지켜지지 않은 약속
-
원숭이 사냥법
-
왜 여행을 떠나는가
-
슬픔이 없는 곳
-
아이의 웃음
-
언제까지 예쁠 수 있을까?
-
벼랑 끝에 섰을 때 잠재력은 살아난다
-
할머니의 사랑
-
그대 거기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2) - 도종환
-
1분
-
한 시간 명상이 10 시간의 잠과 같다
-
후회하지마!
-
어린이라는 패러다임 / 도종환
-
나는 너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
쉬어갈 곳
-
'사랑한다'
-
행복을 부르는 생각
-
벌새가 날아드는 이유
-
용서를 비는 기도